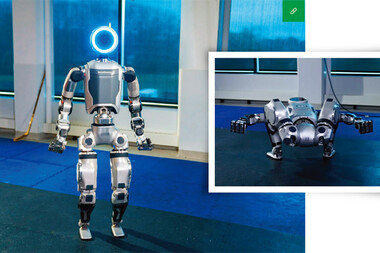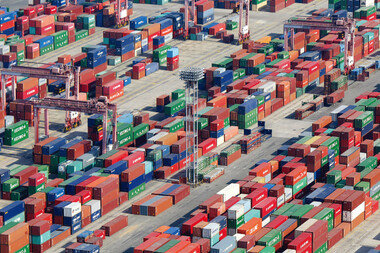![빌보드 핫 100 차트(왼쪽)와 지난 4월 음원차트 역주행으로 논란의 주인공이 된 가수 닐로. [빌보드 홈페이지, 사진 제공 · 리메즈엔터테인먼트]](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5a/ec/05/48/5aec05480605d2738de6.jpg)
빌보드 핫 100 차트(왼쪽)와 지난 4월 음원차트 역주행으로 논란의 주인공이 된 가수 닐로. [빌보드 홈페이지, 사진 제공 · 리메즈엔터테인먼트]
“차트는 살아 있는 사회적 역사다. 즉, 듣는 이들은 롤링 스톤스의 ‘(I Can’t Get No) Satisfaction’이나 도나 서머의 ‘I Feel Love’를 그냥 들어서는 그 음악이 얼마나 충격적인지에 대해 알 길이 없다. Satisfaction은 빌보드 차트 10위권에 함께 머물러 있었던 제이 앤 더 아메리칸스의 ‘Cara Mia’나 패티 페이지의 ‘Hush Hush Sweet Charlotte’ 같은 성인 취향의 톱10 히트 팝송과 함께 듣고, I Feel Love는 그 위아래에 포진해 있던 스티븐 비숍의 ‘On And On’과 데비 분의 ‘You Light Up My Life’와 함께 들어야 이 음악들이 당시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차트에서 모든 것들은 콘텍스트가 된다.”
한 시대 명곡이 가진 가치는 평론가의 언술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동시대 차트에서 그 노래와 경쟁한 곡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노래가 가졌던 선도성과 그에 감응했던 대중의 수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다. 굳이 해외 사례를 꼽지 않더라도 산울림의 ‘아니 벌써’, 조용필의 ‘단발머리’,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같은 지난 세기 명곡이자 히트곡을 떠올린다면 이해가 쉬울 테다.
그리하여 차트란 대중의 무의식을 짚어낼 수 있는 지도이자, 한 시대의 날씨 기록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런 역할을 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 모든 노래가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반 판매량,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건수, 방송 횟수 등등 산출 가능한 모든 지표를 바탕으로 최대한 정확히 통계를 내야 한다.
미국 빌보드나 일본 오리콘이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 이유는 이런 바탕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옛 히트곡을 소개할 때 ‘몇 년도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몇 주간 1위를 한…’이란 설명이 덧붙고 설득력도 얻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 차트는 어떤가. 과거 절대적 신임을 얻었던 ‘가요톱10’ 시대가 끝난 후 차트라는 권위는 무주공산이 되고 말았다. 2000년대 초 · 중반까지 그랬다. 음악계 안팎에서 공정한 차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고 한터차트, 가온차트 등이 나왔지만 이렇다 할 영향력을 얻지 못했다. 그 시기 영화계가 통합전산망을 바탕으로 정밀한 박스오피스 시스템을 구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다. 정확히 말하자면 음원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 중인 멜론 차트다. 음원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즉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이 얼마나 이뤄지느냐가 집계 기준의 전부다. 그렇다 보니 사회적 역사는커녕 아이돌 팬덤의 전쟁 기록지, 음원 사재기꾼의 혈투장이 돼버렸다.
얼마 전 가수 닐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좋아요’ 수 조작 및 음원 사재기 의혹이 있었다. 실시간 차트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비현실적이다. 그보다는 영화계의 통합전산망 같은 신뢰할 만한 공공 차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효과적일 테다.
케이팝(K-pop)이 수출 상품으로 자리 잡은 지금, 좀 더 공정한 차트는 세계 팬들에게 다양한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창구가 될 것이다.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