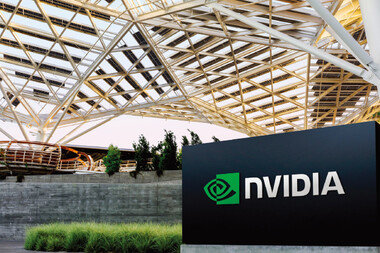![[사진 제공 · CGV 아트하우스]](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5c/38/1d/9c/5c381d9c0ba8d2738de6.jpg)
[사진 제공 · CGV 아트하우스]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는 지식인 관객이나 흑인 관객을 대상으로 독립영화계에서 주로 제작하던 것에서 벗어나 2010년대에는 할리우드 주류 영화 또는 아카데미상을 노리는 규모가 큰 예술영화에서도 흑인 이슈와 흑인 주인공을 흔히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1960년대 흑인 가정부들의 애환을 그린 ‘헬프’(2011)에 출연한 옥타비아 스펜서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깜짝 수상한 이후 주류 영화계에서 흑인 소재를 영화화하는 일이 더는 특별한 기획은 아닌 것이 됐다. 1840년대 노예제 시대를 그린 ‘노예 12년’(2013)과 성소수자 흑인 소년의 성장기를 담은 ‘문라이트’(2016)가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을 수상했고, ‘장고 : 분노의 추적자’(2012)와 ‘히든 피겨스’(2016)의 탄탄한 성공을 거쳐, 흑인 히어로들이 일대 혈전을 펼치는 마블영화 ‘블랙 팬서’(2018)까지 뉴 블랙시네마는 전방위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제는 ‘흑인 영화가 흥행에 돌풍을 일으킨다’거나 ‘흑인 영화인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시대다.
뉴 블랙시네마의 시대
![[사진 제공 · CGV 아트하우스]](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5c/38/1d/c2/5c381dc21c19d2738de6.jpg)
[사진 제공 · CGV 아트하우스]
‘그린 북’은 인종적 갈등이나 화합을 매우 유연하게 다루는 코미디영화다. 영화 배경은 1962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해 남부로 떠나는 여행길을 동행한 두 사람은 흑인 남자와 백인 남자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지만, 흑백분리정책은 여전했다. 흑인이 백인 전용 자리에 앉는 ‘싯인(sit-in)운동’은 시작됐지만, 마틴 루서 킹 목사를 리더로 한 흑인민권운동은 아직 조직되지 않은 시기였다.
이 영화는 상류층 흑인 보스와 하층민 백인 운전사가 함께 떠나는 여행을 그리는 로드무비이면서 ‘리썰 웨폰’ ‘맨 인 블랙’ 같은 흑백 버디무비 장르를 비튼다. 운명적으로 만난 두 남자는 인종차별이라는 관행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 있는 거대한 불구덩이로 뛰어든다.
이탈리아에서 뉴욕 브롱크스로 대가족과 함께 이주한 토니(비고 모텐슨 분)는 나이트클럽에서 거친 일을 하고 가끔 주먹도 휘두르며 가족을 부양한다.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자 그는 일자리가 필요해진다. 유명 피아니스트인 돈 셜리(마헤르샬랄하스바스 알리 분)는 맨해튼 중에서도 중심에 자리한 카네기홀 바로 위층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
일자리를 위해 셜리를 찾아온 토니는 귀족적인 품위와 우아함으로 똘똘 뭉친 고용주가 흑인인 점이 걸리지만 곤궁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취업한다. 미국 전역으로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된 셜리에게는 흑인인 자신을 보호해줄 거칠고 든든한 백인 운전기사가 필요하다. 마뜩지 않지만 서로에게 필요해진 두 사람은 흑인 전용 호텔과 레스토랑이 수록된 ‘그린 북’을 들고 남부를 향한 여정에 오른다.
믿기지 않는 실화에 토대
![[사진 제공 · CGV 아트하우스]](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5c/38/1d/db/5c381ddb0eb3d2738de6.jpg)
[사진 제공 · CGV 아트하우스]
흑인 고용주의 명령이 탐탁지 않은 토니와 거칠고 제멋대로인 피고용인이 거슬리는 셜리, 두 사람의 여정이 순탄할 리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을 더욱 힘겹게 만든 것은 남부로 향할수록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를 ‘재주 좋은 흑인 노예’ 정도로 취급하는 백인 사회의 뻔뻔함과 교만함이다. 그런 사회가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토니를 백인으로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토니는 “반은 흑인이잖아”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깨닫는다.
토니는 셜리에게 “당신네 사람의 음악”인 로큰롤을 들려주고, 셜리는 토니가 아내에게 쓰는 편지에 멋진 문학적 수사를 덧붙여 소통하는 맛을 알려줄 때 두 사람은 함께 사는 것의 의미를 점차 깨달으며 친구가 돼간다.
영화는 갈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교훈을 섣불리 주입하려 들지 않는다. 게다가 많은 갈등이 두 사람의 개과천선으로 억지로 봉합되지도 않는다. 두 사람은 모두 약점을 가진 문제적 인간이며,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기에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영화 서두에서 토니가 노골적 차별주의자였다면, 셜리는 자신이 속한 인종을 부끄러워하며 벗어나려고 했던 인물로 토니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별 생각 없이 몰라서 그랬던 토니와 지적으로 우월하지만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걸었던 셜리의 별난 관계는 미국 남부라는 거대한 장벽 속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진다.
이 작품은 1월 6일(현지시각) 미국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뮤지컬&코미디 부문 작품상, 각본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으며 곧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강력한 작품상 후보다. 그러나 거창한 수상 결과보다 누군가와 편지를 주고받고 치킨과 피자를 가족, 친구와 함께 마음껏 먹고 싶게 하는, 한없이 사랑스럽고 맛있는 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