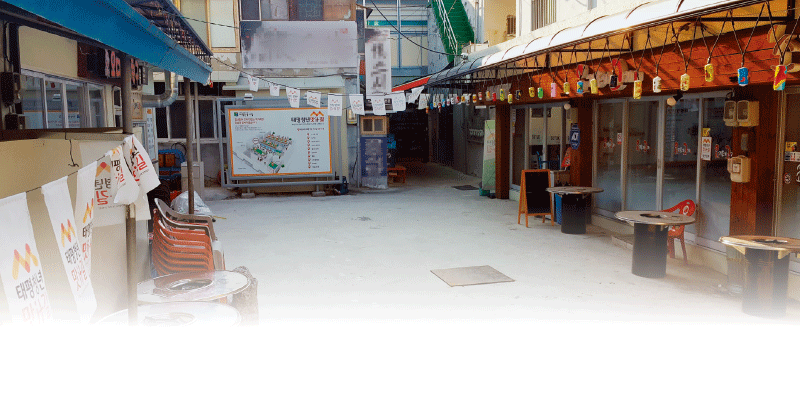
하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보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줄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요식업 같은 생계형 창업에 그쳤다. 게다가 청년이 창업한 기업의 폐업률도 높아 일각에서는 “청년창업지원 사업이 매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중기청) 공시에 따르면 2013년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창업자 수는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2013년 2만1311명으로 창업자 수가 소폭 늘어난 데 이어 2014년 2만2806명, 2015년 2만5404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만6945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체 창업자 중 39세 미만의 비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8%가량으로 일정했다. 창업자 수가 소폭 늘었을 뿐 창업생태계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대로인 셈이다.
돈은 돈대로 들였지만 결과는…
정부의 창업지원이 청년층의 구미를 끌지 못했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창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창업을 구체적으로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20, 30대 청년의 비율은 69.3%로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막 시작한 2013년에 비해 1.2%p 상승했다.일부 청년은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으려고 창업하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창업동아리에서 활동한 대학생 정모(27) 씨는 “대학생이 창업한 뒤 수익을 내 투자까지 받는 경우는 30%에도 못 미친다. 대부분 자기소개서에 넣을 한 줄 이력을 위해 창업동아리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결국 서류상 창업주일 뿐, 대부분 스펙을 쌓으려는 취업준비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중기청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이 창업한 기업 750개 가운데 매출이 없는 곳이 267개에 달했다. 대학생 창업 기업당 평균적으로 받는 정부 지원금은 5280만 원이었지만, 대학생 창업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223만 원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금에 비해 학생 창업의 효과가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창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보다 신기술 창업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대학생 창업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모(28) 씨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문과(인문, 사회, 상경)계열 학생이 창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이 문화 콘텐츠나 IT 관련 기업을 창업해 수익을 내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기술창업에 맞춰져 있어 지원받기 어렵다. 오히려 수익구조에 대한 계획 없이 신기술을 가진 프로젝트팀이 지원금을 받는 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도 관련 기술을 이미 영업 중인 기업에 넘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특별히 기술창업에 지원금이 치중된 것은 아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맡은 기업 관계자들이 신기술 관련 창업 아이템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아이디어 창업 외 요식업이나 공방 등 일반 창업에 도전한 청년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사업체를 가진 20대 대표자 수는 2013년 6만7365명에서 2014년 말 8만2988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들 중 약 64%(5만3010명)가 숙박·요식·소매점 같은 생계형 창업이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청년 창업자의 5년 생존율은 16%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8월 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손을 잡고 ‘청년상인 드림몰’(드림몰)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청년상인에게 점포당 최대 2500만 원 지원금을 주고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내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사업이었다.
그동안 전국 20개 전통시장의 청년상인 점포 218곳에 총 47억여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중기청 조사 결과 지원금 지급 기간 1년이 끝나자 약 20%의 청년상인 점포가 폐업했다.
허울뿐인 전통시장 청년상인지원 사업

청년상인들은 전통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이모(31) 씨는 “점포가 비어 있는 곳은 다 이유가 있다. 안 그래도 손님이 줄고 있는 전통시장에서도 인적이 드문 곳의 점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서 가죽 공방을 운영하던 유모(33) 씨도 “공방을 찾는 젊은 층이 전통시장에 오는 경우가 드물어 손님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점포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했고, 인터넷 매장과 공예 교습을 통해 수익을 냈다. 중기청의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는 전통시장 내 매장을 유지할 여력이 없어 폐업했다”고 밝혔다.
청년상인들이 전통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기청은 또 다른 청년상인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14개 시장에서 장사할 청년상인 점포 301개를 선정해 지원하는 ‘청년몰’ 사업 계획을 내놓은 것. 드림몰 사업이 개별 점포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청년몰 사업은 전통시장 내 청년 점포 20개 이상을 모아 쇼핑몰처럼 꾸미는 것.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청년몰을 운영하려는 지자체에 각각 15억 원 이내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월 17일 세종시의 청년몰 사업이 기존 상인회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 초기 일부 청년상인이 건물주나 상인회의 반대로 시장 진입이 늦춰지면서 관리와 지원을 제대로 못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추가로 들어온 청년상인들은 예정대로 지원받고 있어 폐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청년몰 사업은 과거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20개 점포를 전부 지자체가 구매해 청년상인에게 임대하는 형태다. 이와 동시에 중기청이 나서 시장 전체의 마케팅을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