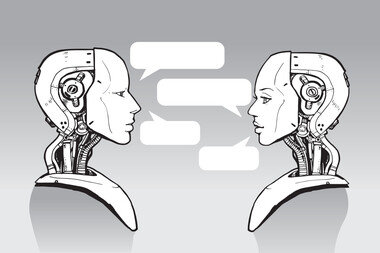메이저대회 최저 타수가 일반 대회처럼 63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PGA투어 일반 대회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대회장으로 쓰는 골프장의 난이도 편차가 심하다. 그랜드 오픈과 함께 홍보 차원에서 대회를 열기도 한다. 대회가 한 해에만 40개 이상 열리다 보니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코스가 쉬워지는 경우도 간혹 있다. PGA투어 선수 중에는 평균 비거리가 300야드(약 274m)를 넘는 선수가 많아서 평이한 코스는 선수들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반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메이저대회는 최고 선수들이 출전하는 만큼 코스가 극도로 어려워진다. US오픈은 선수를 떨어뜨리려고 코스를 세팅한다. 코스가 어려워야 선수의 기량도 발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떨까. 역대 최저타는 61타다. 2001년 남서울CC에서 열린 매경오픈 4라운드(대만 중친싱)와 지산CC에서 열린 2006년 지산리조트오픈 1라운드(호주 마크 리슈먼)에서 나온 결과다. 신장 191cm의 리슈먼은 버디 9개에 이글 1개로 11언더파를 치면서 첫날부터 대회를 압도했다. 그보다 1타 적은 62타는 지금까지 13번이나 나왔다.
내셔널타이틀이 걸린 한국 최대 메이저대회 코오롱한국오픈의 한 라운드 최저타 기록은 8언더파 63타다. 지난 14년간 대회가 열린 충남 천안시 우정힐스CC는 2006년 강지만과 강경남이 2라운드에서, 2011년 리키 파울러가 3라운드에서 각각 이 기록을 만들었다. 올해는 이창우가 9월 9일 열린 2라운드에서 63타를 쳤다. 우정힐스CC는 한국오픈을 위해 코스 난도를 국내에서 가장 어렵게 세팅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다. 2002년까지 한국오픈이 열린 경기 고양시 한양CC 신코스가 스페인의 19세 골퍼 세르히오 가르시아에게 유린당했기 때문이다. 2002년 대회에 초청된 가르시아는 첫날 67타를 시작으로 65-66-67타를 치면서 나흘 합계 23언더파 265타로 우승했다. 이에 심기가 불편해진 당시 대한골프협회(KGA) 회장이던 고(故) 이동찬 코오롱그룹 회장은 이듬해부터 자신이 만든 우정힐스CC로 한국오픈 무대를 옮겨 “코스 난도를 어렵게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매년 이 코스는 어려워졌고, 우승 스코어도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올여름은 긴 폭염의 영향인지 그린이 무뎌졌다. 폭염 뒤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러프 잔디들도 성장을 멈춰버렸다. 비교적 선수가 공략하기 쉬운 코스가 된 것. 이창우의 코스 레코드 63타 기록도 그렇게 나온 것이다. 아마 내년 우정힐스CC는 벼르고 별러 한국오픈을 찾는 선수를 맞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