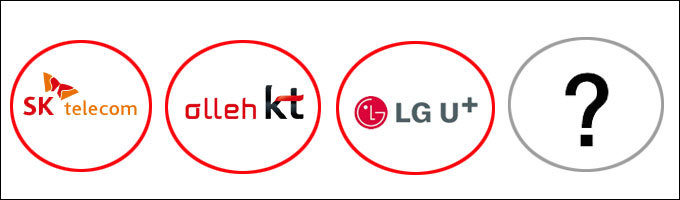
터무니없는 목표 예견된 결과
국제전화, 유선전화, 무선인터넷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온세텔레콤과 KT 재판매 회사인 에넥스텔레콤 그리고 케이블 TV업계가 MVNO 진출에 출사표를 던졌다.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4 이동통신사의 출현은 더욱 가시화됐다. 유통업체, 금융회사, 정보기술업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 컨소시엄은 6월 “4세대(4G) 이동통신기술인 와이브로(초고속 휴대용 인터넷)로 전국망을 구축해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보다 20% 싼 요금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이동통신사업권을 신청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이르면 연내 제4 이동통신사가 출현할 것처럼 보였지만 방통위가 KMI의 사업허가 신청에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11월 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외부 전문 심사위원들이 KMI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비현실적이고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해 KMI가 허가 점수를 얻지 못했다”며 탈락을 결정했다. KMI는 100점 만점에 65.5점을 얻어 심사항목별로는 최저 점수인 60점을 모두 넘었지만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
KMI의 실패를 두고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MVNO 진출을 준비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KMI는 수조 원을 들여 와이브로망을 구축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MVNO라기보다는 MNO에 가깝다”며 “6년 투자를 해서 기존 이동통신시장의 20%에 이르는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1997년 019 번호를 받고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한 LGT마저 후발주자로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KMI가 탈락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컨소시엄 구성 전부터 지적돼온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었다. KMI는 2016년까지 5조1600억 원을 투자해 그해 6월까지 88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전체 투자금의 47~48%를 충당하겠다는 것. 이에 방통위는 “사업계획에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을 20% 인하해 전체 통신시장 규모의 20%에 이르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확보하고, 여기서 나오는 매출을 전제로 5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장전망에 따른 사업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주주사들이 통신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고, 향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었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6월 KMI와 사업제휴 협약을 맺어 최대주주가 됐던 삼영홀딩스가 고작 3개월 만에 중도하차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조달 여력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KMI에 참여하는 주요 주주 6개사가 9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재무 능력이나 자금조달 문제 등 일부에서 제기하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사업허가 전에 자본금 3000억 원을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온세텔과 케이블업계 준비 잰걸음

11월 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KMI의 이동통신사업권 신청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방통위 회의 개의를 선언하는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토종 와이브로가 세계 이동통신기술을 주도하는데도 정작 국내에선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3세대 과실 따먹기에 안주하면서 와이브로 주파수는 사실상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와이브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가입자는 35만 명 수준에 그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반드시 특정 업체를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방통위가 정말 와이브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활성화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힘을 실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했지만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면서 정책적 실기를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지나치게 경직된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문형남 교수는 “이동통신시장 자체가 신규 사업자가 나오기 어렵고, 설사 나온다 해도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자생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며 “방통위가 자격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들이대 사실상 제4 이동통신사의 출현을 막은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비록 KMI의 도전이 실패로 끝났지만 MVNO는 이미 시대적 대세가 됐다. 미국, 유럽, 일본에선 수십, 수백 개의 MVNO가 활동하고 있다. 1999년 세계 최초로 MVNO 상업화에 성공한 영국의 버진 모바일(Virgin Mobile)은 서비스 개시 5년 만에 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KMI 공종렬 대표는 방통위 허가심사 탈락 직후 “한국 정보통신의 밝은 미래와 지금까지 준비해온 4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최단시간 안에 더 나은 내용으로 사업허가 신청을 다시 하겠다”며 재도전 의지를 밝혔다.
온세텔레콤 역시 ‘매출 1조 원 5년 누적 가입자 200만 명’을 목표로 2011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방통위가 기존 이동통신사와 MVNO 간의 통신망 재판매 가격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따라 SKT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단독으로 MVNO를 준비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국내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도 있다. 단말기 공급과 관련해서도 해외 업체 및 수출 위주의 국내 제조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2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정말 (제4 이동통신사) 하나 탄생시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말했을 만큼 제4 이동통신사의 출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의 공고한 독과점 체제를 깨는 한국판 ‘버진 모바일’의 등장이 언제쯤 가능할지,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













![[영상] “내년 서울 집값 우상향… <br>세금 중과 카드 나와도 하락 없다”](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48/a8/ac/6948a8ac1ee8a0a0a0a.png)


![[영상] “우리 인구의 20% 차지하는 70년대생, <br>은퇴 준비 발등의 불”](https://dimg.donga.com/a/380/253/95/1/carriage/MAGAZINE/images/weekly_main_top/6949de1604b5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