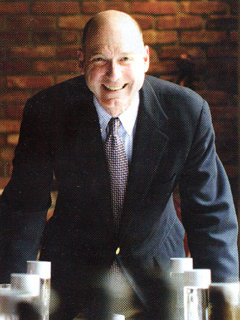
와인 전문가 매트 크레이머.
좋은 와인은 모름지기 그 포도밭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믿는 그는 와인에선 테루아(terroir·토양과 기후 등의 모든 자연 요소)가 가장 중요하며, 테루아는 양조 문화와 전통이 깊어야 표현된다고 주장했다. 어떤 와인의 향기를 맡고 맛을 봐서 그 밭의 특질이 느껴진다면, 그 와인은 테루아를 드러낸다고 한다.
그 밭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꼽지는 못해도, 어디쯤엔가 어렴풋이 그런 맛을 품고 있는 밭이 있으리라고 믿는 경우인 것이다. 맛을 보고 향을 맡아도 도무지 와인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경우라든지, 아무 데서나 혹은 어디를 가도 비슷한 맛과 향기를 풍기는 와인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면 그 와인은 테루아가 표현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어로 된 테루아를 ‘some whereness’라는 말로 풀이했다. 어딘가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특징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시음한 레드 와인 중에서 샤토 몬텔레나는 다른 와인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나파밸리의 최북단에서 카베르네 소비뇽 100%로 만들었다. 2003 샤토 몬텔레나는 완숙한 포도 향기 외에도 산뜻한 기운이 있어 생기가 돌았고, 깔끔하면서도 풍성한 입맛을 제공했으며, 깨끗하고 분명한 질감이 돋보였다. 포도밭이 어디쯤엔가 있을 법한 개성이 맛에 녹아 있었다.
매트 크레이머는 유럽에서 만개한 와인 문화 중에 단일품종으로 와인을 양조하는 전통은 수도원의 공로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서로마제국에 이어 동로마제국이 멸망하고 유럽은 암흑의 시기, 중세를 맞는다. 이교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유럽인들은 영성의 고갈을 체험하며 괴로워하다 드디어 큰 깨달음을 얻는다. 베네딕트 수사들에 의해 유지되는 수도원에서 본격적으로 와인을 양조하기 시작한다. 여러 포도를 혼합하지 않고 한 가지 포도만으로 농사를 지어 그 땅의 기운에 귀를 기울였다.
프랑스 부르고뉴와 루아르 그리고 독일 모젤에서 터를 잡고 수련하던 수도사들은 항상 하늘의 가르침을 고대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고달픈 수행을 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고, 그 행위는 땅에서 이뤄짐을 깨달았다. 그들은 땅을 부지런히 갈고 가꿔가며 땅의 목소리를 통해 하늘의 분부를 얻고자 했다.
포도의 맛은 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도사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이 사실을 간파했다. 땅의 목소리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던 터라 그 땅에서 나온 포도의 맛으로 땅의 기운을 구분했다. 부르고뉴의 본 로마네 마을을 보자. 이곳은 레드 품종인 피노 누아만 키운다. 마을 뒤로 이어지는 오르막을 오르면 350m 정도의 완만한 산을 만날 수 있다. 마을과 산 사이의 구릉으로 동향 언덕이 발달해 있다. 마차 한 대가 겨우 지날 만한 좁다란 길을 사이에 두고 한 밭과 또 다른 밭은 무척이나 다른 대접을 받는다. 두 밭은 돌을 던지면 닿을 아주 짧은 거리에 있다. 그 두 밭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수도사들은 피노 누아 혹은 샤르도네의 맛이 서로 다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 사실을 기초로 해 특정 밭에 이름을 붙이고 다른 밭과 구분했는데, 오늘날 그 차이는 와인 품질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이런 다양성과 차이가 와인의 매력이라며 말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