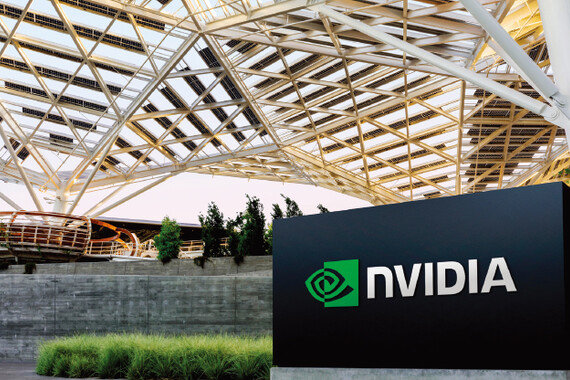특히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수들이 개입해 이뤄내는 주가의 움직임이란 일찍부터 순수 과학자들의 눈에도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다. 적지 않은 과학자들이 주가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해왔다.
물리학자들이 찾아낸 대표적인 대박의 비밀은 ‘프랙털(practal)’이다. 프랙털이란 단순한 그림이 반복돼 복잡한 그림을 만드는 것이다. 전체 모습이 단순한 기본 구조와 닮았고 반복한다는 것이 프랙털의 키워드다.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프랙털이 번개, 해안 구조, 고사리 등이다.
파생상품 제로섬 규칙 적용
포항공대 물리학과 김승환 교수는 “물리학자들은 주가 변화 그래프 속에 다중 프랙털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다. 다중 프랙털은 여러 성질의 프랙털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여러 종류의 그래프가 반복돼 전체 주가 그래프를 만든다는 뜻이다. 만일 각각의 작은 그래프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들이 반복되는 규칙을 발견한다면 전체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 상품 중 가장 복잡한 것이 파생상품이다. 선물, 옵션, 스왑 등으로 이뤄진 파생상품은 미래에 거래될 상품을 현재에 가격을 정해 미리 거래하는 것이다. 잘 정하면 대박이지만 조금만 삐끗해도 쪽박을 면하기 힘들다. 철저한 제로섬 규칙이 적용되는 머니게임이 파생상품인 것. 물리학은 이 분야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바로 옵션 상품의 가격을 정하는 데 쓰이는 열역학이다.
1973년 물리학자 피셔 블랙과 경영학자 마이런 숄즈는 주식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공식을 만들었다.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하면 옵션 판매에 따르는 위험을 95%까지 없앨 수 있어 옵션 거래에 혁명을 일으켰다. 마이런 숄즈와 로버트 머턴은 이 업적으로 199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블랙은 1995년 사망해 아쉽게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블랙-숄즈의 모형은 주식가격이 브라운운동과 비슷하다는 관찰에서 시작한다. 브라운운동은 물 위에 떨어진 꽃가루가 다양하게 움직이는 액체 분자에 부딪혀 복잡하게 움직이는 현상이다. 수리물리 이론은 이 현상을 숫자와 수식으로 바꿔 잘 설명해준다. 그중 하나가 아인슈타인이 1905년 세운 열전도 방정식인데 공기중에서 입자의 확산을 잘 설명한다(이 업적은 아인슈타인의 3대 업적으로 꼽힌다).

번개와 같이 단순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전체 구조를 형성하는 프랙털 모습은 주가 그래프를 이해하는 하나의 유용한 이론이 될 수 있다.
사실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이 최첨단 금융상품으로 발전한 배경에는 로켓과학자의 공로가 컸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구조조정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서 대거 월가로 진출하였다. 수학, 물리 이론으로 무장된 이들은 기존 경제학자들조차 꺼렸던 파생상품을 비롯한 복잡한 금융상품을 만들었다.
고전 경제학은 주식시장을 효율적인 시장으로 본다. 주가는 술 취한 사람이 걷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움직이면서도 늘 평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들은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잘 적용된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급격한 요동, 주가 거품의 형성과 붕괴 등 매우 역동적인 현상은 기존 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한편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수리물리학은 경제 현상에 대한 역동적인 이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물리학자들은 주식시장이 복잡계의 일종이라고 말한다. 복잡계의 대표적인 현상이 날씨다. 흔히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처럼 복잡계는 많은 수의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집단 현상을 만들어낸다. 주식시장도 비슷하다.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조직, 기관, 투자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움직이다 때로는 머니 시장의 태풍(폭락과 폭등)을 일으킨다.
고도로 정교한 상품 만들어내
물리학이 이처럼 대박 찾기에 나섰는데 수학이 가만 있을 리가 없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분산투자는 주식 투자의 큰 흐름이다. 왜 분산투자가 좋은 걸까. 막연히 여러 종목에 투자해놓으면 안전하다는 것일까. 그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한 투자자에게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자. A, B, C라는 주식이 있는데 각 자산의 수익률은 각각 10%, 20%, 30%이고 위험(리스크)은 10%다. 어느 상품에 투자해야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일단 드는 생각은 C에 ‘올인’하는 것이다. 위험은 똑같고 수익률은 C가 가장 높다면 C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A, B, C에 적당히 돈을 나누어서 투자하면 수익률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도 위험을 10% 이하로 줄일 수 있다(분산을 다룬 복잡한 수식이 필요하다). 중앙대 상경학부 장경천 교수는 “이것이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 선택이론’으로, 그는 199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며 “일반적으로 15개 이상의 주식에 분산투자하면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의 90% 정도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수학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을 금융과 연결한 것이 바로 금융공학이다. 선진국의 대형 금융기관에는 이공계나 금융공학을 전공한 박사급 인력만 수백명이 있고, 이들이 파생상품을 포함한 복잡한 거래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ELS 상품도 파생상품의 하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변석준 교수는 “지난해 국내 은행이 거둔 전체 영업이익 중 파생상품 거래에서 얻은 이익은 3.5%인 데 비해,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전체 이익 중 87.5%가 여기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공학을 이용해 고도로 정교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전문가를 ‘콴트’(Quant, Quantative Analyst)라고 한다. 머니 시장에서 떠오르는 신종 직업이다.
과학이 머니 시장에서 맹활약을 하는 흐름에 맞춰 KAIST도 내년부터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금융공학 전문가를 대폭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 KAIST는 테크노경영대학원의 한 과정으로 금융공학을 가르치고 있다. 금융전문대학원은 학생 수도 2배 이상 늘고(석사 200여명) 프로그램도 훨씬 다양해진다.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책임자인 김동석 교수는 “앞으로 금융상품이 갈수록 복잡해져 뛰어난 수학·과학 능력과 금융 지식을 갖춘 콴트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