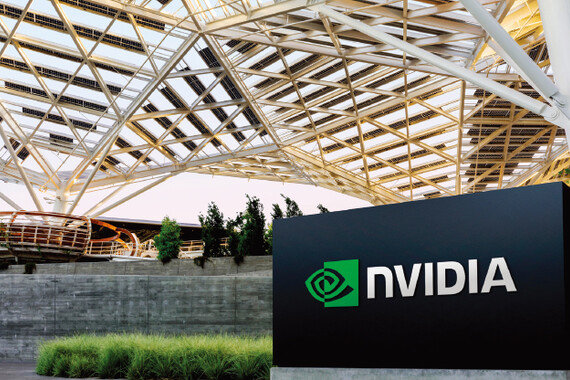세계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플랫폼 전쟁에 불이 붙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은 너나없이 각자의 플랫폼(platform)을 전 세계 시장에 보급하고자 팔을 걷어붙인 상태다. 얼마 전 여기에 한국 최대 기업 삼성이 가세했다. 삼성이 주도하는 타이젠 연합의 운영체계(OS) ‘타이젠’을 적용한 스마트폰을 인도에 내놓으면서다.
플랫폼이란 무엇일까. 플랫폼은 좁은 의미로는 특정 장치나 시스템을 만들 때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이란 뜻이다.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생태계로까지 의미가 넓어졌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IT 기업은 여러 사업을 벌인다. 건물을 짓기 전 세우는 뼈대가 플랫폼이라면, 이를 기반으로 건물주는 아파트나 사무용 빌딩 등 여러 용도의 건축물(사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다만 웹 플랫폼은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수(數)의 개념이 없어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애플을 들 수 있다. 애플은 단순히 ‘아이폰’ 하나로 글로벌 기업으로 급부상한 게 아니다. 아이폰을 내놓기 전부터 매킨토시(맥) 운용 소프트웨어를 내놓았고, 아이폰에는 ‘iOS’를 적용했다. 그리고 이 두 프로그램을 연결해 플랫폼으로 만들었다.
웹 플랫폼 적응하면 이동 쉽지 않아
상상해보자. 애플 컴퓨터 ‘맥북’으로 애플이 만든 대용량 데이터 저장 시스템인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한다.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로 찍은 사진들을 별도로 옮길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얼마 전 아는 사람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을 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 ‘애플스토어’에 접속해 그 앱을 다운로드한다. 이 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공유하기’를 누르거나 아이폰을 쓰는 친구에게 무료로 ‘아이메시지’를 보내 추천한다.
이때 우리는 애플의 생태계 속에 사는 게 된다. 일단 특정 플랫폼으로 웹 속 생태계에 들어가면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기계가 고장 나면 다른 회사 제품으로 갈아타면 그만이지만 웹 플랫폼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니 IT 기업은 저마다의 플랫폼을 마련해 사람들을 자신의 품속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플랫폼이 엄청난 수익 창출의 근원이 되는 셈이다.
게다가 현대인은 24시간 전자기기와 함께한다. 얻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기를 온라인 세상에 연결하는 게 사물인터넷(IoT)이라면, 플랫폼은 사물인터넷 시대에서 IT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초적 자산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신규 출시할 모든 삼성 TV에 자신들의 플랫폼 타이젠을 기본 탑재하기로 했다. 운영체계가 도입될 세탁기나 냉장고 등 생활 가전기기에도 전부 타이젠을 쓰기로 했다. 스마트워치 등 착용형 기기도 마찬가지다. 이쯤이면 타이젠에 ‘올인’하는 셈이다.
하지만 한 가지 빠졌다. 수많은 현대인이 24시간 함께하는 전자기기, 스마트폰이다. 플랫폼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모바일 운영체계다. 이번 타이젠 폰 출시가 삼성전자가 플랫폼 전쟁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세계 플랫폼 시장은 구글과 애플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모바일 운영체계 시장 점유율만 봐도 알 수 있다. 구글은 지난해 2분기 모바일 운영체계 시장의 56.2%를 차지했다. 애플은 32.1%다.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구글 플랫폼에, 3분의 1이 애플 플랫폼에 속해 있다.
컴퓨터 시대의 강자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 시장에서 9.1%를, 블랙베리는 2.3%를 점유하는 데 그쳐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윈도 모바일은 다년간 노력에도 구글과 애플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삼성전자의 도전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타이젠 실패 땐 타격 커
삼성전자 측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인도다. 구글과 애플의 양강 구도가 고착화한 선진국과 달리 인도는 업계가 바라보는 새 먹거리다. 중국은 이미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예전만큼 높지 않다. 인도는 12억 인구 가운데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이 11%에 불과하다. 3년 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젊은 세대의 IT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로도 유명하다.
문제는 나머지 삼성전자의 전략이 오판일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인도 시장에서 타이젠을 탑재한‘Z1’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소비자는 Z1의 기능이 낮다고 지적한다. 한 소비자는 “전·후면 카메라만 보면 마치 2010년에 나온 휴대전화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저가 시장을 공략하고자 5700루피, 우리 돈으로 10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에 제품을 판매한다. 하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현지에서 더 좋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살 수 있고, 이미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인도 시장 진출을 선언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타이젠 스마트폰이 단순한 사용자환경(UI), 고속 웹 페이지 로딩, 오래 유지되는 배터리 등을 갖췄다고 했지만 이 정도론 부족하다.
결국 애초 타이젠을 저가 제품으로 내놓지 말았어야 하거나(다시 말해 프리미엄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저가라도 확실히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제품을 내놨어야 한다는 평가다.
게다가 아직 모바일 운영체계의 핵심인 앱 및 콘텐츠 생태계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다. 현재 타이젠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은 1000개가 살짝 넘는다. 많아 보이지만, 구글플레이에서 받을 수 있는 앱의 극히 일부다.
타이젠용 앱을 개발하는 업체들도 찾아보기 힘들다. 앱 업체들도 구글이나 애플 등 자신의 앱이 잘 팔릴 만한 시장을 선호한다. 플랫폼 시장에서 구글, 애플의 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 소비자나 앱 개발자 모두를 휘어잡을 유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역부족이다.
타이젠 연합의 다른 멤버인 인텔, KT 등은 타이젠이 실패한들 입을 타격이 적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르다. 최악에는 스마트폰, 가전 등 하드웨어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라도 타이젠은 필수적이다.
승산은 있다.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강해 타이젠의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하드웨어 시장 1위 지위를 활용해 타이젠을 시장에 보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말이다. 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단기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사업 전략은 금물이다.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주사위의 도착지는 시장에, 삼성 손에 달렸다. 삼성전자의 행보를 주목할 따름이다.
플랫폼이란 무엇일까. 플랫폼은 좁은 의미로는 특정 장치나 시스템을 만들 때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이란 뜻이다.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생태계로까지 의미가 넓어졌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IT 기업은 여러 사업을 벌인다. 건물을 짓기 전 세우는 뼈대가 플랫폼이라면, 이를 기반으로 건물주는 아파트나 사무용 빌딩 등 여러 용도의 건축물(사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다만 웹 플랫폼은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수(數)의 개념이 없어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애플을 들 수 있다. 애플은 단순히 ‘아이폰’ 하나로 글로벌 기업으로 급부상한 게 아니다. 아이폰을 내놓기 전부터 매킨토시(맥) 운용 소프트웨어를 내놓았고, 아이폰에는 ‘iOS’를 적용했다. 그리고 이 두 프로그램을 연결해 플랫폼으로 만들었다.
웹 플랫폼 적응하면 이동 쉽지 않아
상상해보자. 애플 컴퓨터 ‘맥북’으로 애플이 만든 대용량 데이터 저장 시스템인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한다.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로 찍은 사진들을 별도로 옮길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얼마 전 아는 사람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을 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 ‘애플스토어’에 접속해 그 앱을 다운로드한다. 이 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공유하기’를 누르거나 아이폰을 쓰는 친구에게 무료로 ‘아이메시지’를 보내 추천한다.
이때 우리는 애플의 생태계 속에 사는 게 된다. 일단 특정 플랫폼으로 웹 속 생태계에 들어가면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기계가 고장 나면 다른 회사 제품으로 갈아타면 그만이지만 웹 플랫폼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니 IT 기업은 저마다의 플랫폼을 마련해 사람들을 자신의 품속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플랫폼이 엄청난 수익 창출의 근원이 되는 셈이다.
게다가 현대인은 24시간 전자기기와 함께한다. 얻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기를 온라인 세상에 연결하는 게 사물인터넷(IoT)이라면, 플랫폼은 사물인터넷 시대에서 IT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초적 자산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신규 출시할 모든 삼성 TV에 자신들의 플랫폼 타이젠을 기본 탑재하기로 했다. 운영체계가 도입될 세탁기나 냉장고 등 생활 가전기기에도 전부 타이젠을 쓰기로 했다. 스마트워치 등 착용형 기기도 마찬가지다. 이쯤이면 타이젠에 ‘올인’하는 셈이다.
하지만 한 가지 빠졌다. 수많은 현대인이 24시간 함께하는 전자기기, 스마트폰이다. 플랫폼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모바일 운영체계다. 이번 타이젠 폰 출시가 삼성전자가 플랫폼 전쟁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세계 플랫폼 시장은 구글과 애플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모바일 운영체계 시장 점유율만 봐도 알 수 있다. 구글은 지난해 2분기 모바일 운영체계 시장의 56.2%를 차지했다. 애플은 32.1%다.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구글 플랫폼에, 3분의 1이 애플 플랫폼에 속해 있다.
컴퓨터 시대의 강자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 시장에서 9.1%를, 블랙베리는 2.3%를 점유하는 데 그쳐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윈도 모바일은 다년간 노력에도 구글과 애플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삼성전자의 도전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타이젠 실패 땐 타격 커
삼성전자 측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인도다. 구글과 애플의 양강 구도가 고착화한 선진국과 달리 인도는 업계가 바라보는 새 먹거리다. 중국은 이미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예전만큼 높지 않다. 인도는 12억 인구 가운데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이 11%에 불과하다. 3년 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젊은 세대의 IT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로도 유명하다.
문제는 나머지 삼성전자의 전략이 오판일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인도 시장에서 타이젠을 탑재한‘Z1’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소비자는 Z1의 기능이 낮다고 지적한다. 한 소비자는 “전·후면 카메라만 보면 마치 2010년에 나온 휴대전화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저가 시장을 공략하고자 5700루피, 우리 돈으로 10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에 제품을 판매한다. 하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현지에서 더 좋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살 수 있고, 이미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인도 시장 진출을 선언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타이젠 스마트폰이 단순한 사용자환경(UI), 고속 웹 페이지 로딩, 오래 유지되는 배터리 등을 갖췄다고 했지만 이 정도론 부족하다.
결국 애초 타이젠을 저가 제품으로 내놓지 말았어야 하거나(다시 말해 프리미엄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저가라도 확실히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제품을 내놨어야 한다는 평가다.
게다가 아직 모바일 운영체계의 핵심인 앱 및 콘텐츠 생태계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다. 현재 타이젠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은 1000개가 살짝 넘는다. 많아 보이지만, 구글플레이에서 받을 수 있는 앱의 극히 일부다.
타이젠용 앱을 개발하는 업체들도 찾아보기 힘들다. 앱 업체들도 구글이나 애플 등 자신의 앱이 잘 팔릴 만한 시장을 선호한다. 플랫폼 시장에서 구글, 애플의 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 소비자나 앱 개발자 모두를 휘어잡을 유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역부족이다.
타이젠 연합의 다른 멤버인 인텔, KT 등은 타이젠이 실패한들 입을 타격이 적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르다. 최악에는 스마트폰, 가전 등 하드웨어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라도 타이젠은 필수적이다.
승산은 있다.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강해 타이젠의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하드웨어 시장 1위 지위를 활용해 타이젠을 시장에 보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말이다. 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단기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사업 전략은 금물이다.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주사위의 도착지는 시장에, 삼성 손에 달렸다. 삼성전자의 행보를 주목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