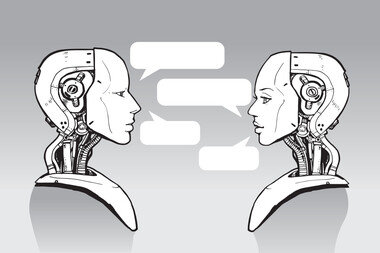골프 한 라운드가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시즌 중 활력소이자 터닝포인트가 되기에는 충분했다. 페블비치에서 골프 라운드를 한 후 컵스는 7경기를 내리 이겼기 때문이다. 당시 남아 있던 13경기 가운데 11경기를 이겨 정규시즌 54경기를 37승17패, 승률 68.5%로 끌어올렸다. 라운드를 하기 전까지 컵스의 승률은 61.7%였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월드시리즈 마지막 7차전에서 구원투수로 뛴 존 레스터는 예약과 스케줄을 책임진 골프 여행의 주모자였다. 포수 데이비드 로스는 7차전에서 홈런을 친 최고령(39세229일) 선수가 됐다. 또 다른 포수 미겔 몬테로는 연장 10회에서 적시타를 쳐 승점을 올렸다. 1루수 앤서니 리초는 5회에서 1타점 2루타를 치는 등 맹활약했다. 선수들끼리 골프를 치면서 의기투합한 것이 이른바 팬을 배척한 데서 비롯된 ‘염소의 저주’도 함께 풀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야구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프로농구(NBA)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한 데는 올해 초부터 선수들에게 최고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게 해준 스티브 커 감독의 ‘당근 정책’이 밑거름이 됐다. 최소한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됐음은 분명하다. 커 감독은 팀의 간판스타이자 핸디캡 1.2의 골프광 스테픈 커리에게 “우승하면 오거스타내셔널GC(골프클럽)에서 라운드를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오거스타내셔널GC는 마스터스가 열리는 프라이빗 코스라 일반인이 라운드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실제 커 감독은 애틀랜타 원정기간인 2월 24일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가 된 커리와 파이널 MVP가 된 앤드리 이궈달라를 훈련에서 빼내 자신이 직접 2시간 동안 차를 몰고 오거스타내셔널GC로 데려가 라운드를 하게 해줬다. 이후 커리와 이궈달라는 그에 부응해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2월 50주년을 맞은 미국미식축구리그(NFL) 최종전 슈퍼볼에서 캐롤라이나 팬서스를 꺾고 우승한 덴버 브롱코스의 쿼터백 페이턴 매닝은 시즌 중에도 골프 라운드를 즐기는 핸디캡 4의 실력파 골퍼다. 불혹의 나이에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은퇴하기까지 MVP에 5번이나 선정됐다. 반면 팬서스의 혈기왕성한 24세 쿼터백 캠 뉴턴은 골프를 즐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중순 2016시즌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스탠리컵 플레이오프에서 피츠버그 펭귄스의 우승을 견인하며 MVP가 된 시드니 크로즈비도 핸디캡 8.2의 뛰어난 골퍼다.
미국의 4대 구기(球技) 프로스포츠인 NFL, MLB, NBA, NHL의 올해 우승을 이끈 선수들은 모두 열성파 골퍼다. 시즌 내내 긴장해야 하는 운동선수에게 골프는 휴식 효과를 주는 동시에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활력소다. 함께 땀 흘리는 동료와도 끈끈하게 연결해주는 일석삼조 기능도 한다. 그들이 우승하는 데 골프는 조미료 구실을 하지 않았을까. 그걸 ‘나비효과’라고 하면 과장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