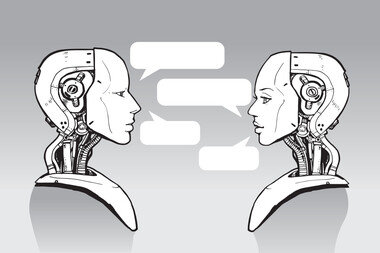쇠고기, 즉 ‘비프(beef)’라는 존스턴의 별명도 웃긴 일화에서 생겨났다. 열두 살 되던 해 친구들은 그의 헤어스타일을 놀려대기 시작했다. “머리에 스테이크를 얹은 것 같아. 머리 모양이 고깃덩어리야.” 그 뒤로 존스턴은 ‘비프헤드’로 불렸고, 이후 줄여서 비프가 됐다. 여기까지 들으면 개인적인 흑역사일 수 있다.
나중에 프로선수가 된 뒤 그는 ‘앤드루 존스턴’이라는 이름으로 서명하다 글자가 많아 손에 무리가 왔다. 그래서 하루는 꼬마가 내민 모자에 그냥 비프라고 쓰고 그 옆에 웃는 얼굴을 그려줬다. 꼬마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고, 그는 아예 서명을 바꿔버렸다. 별명이 이제는 핑크빛 역사가 된 것이다.
비프가 별명인 점에 착안해 각 방송국이 미국 뉴욕 햄버거 맛집 탐방 진행자로 그를 캐스팅했다. 스폰서 계약이 겹치다 보니 한 끼니에 햄버거를 4개씩 먹는 일도 벌어졌다. 속이 메스꺼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지만 두둑한 광고 모델료를 챙긴 후 내내 웃었다고 한다. 이쯤 되면 별명이 돈까지 벌어준 셈이다.
8월 말 미국 뉴저지 주 발투스롤골프클럽에서 열린 PGA챔피언십에 참가했을 때 일이다. 한 남자 갤러리가 다가와 셔츠를 벗고 가슴에 서명을 해달라고 했다. 존스턴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100달러 내기가 걸려 있다”는 남자의 말에 흔쾌히 가슴에 서명을 해줬다.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서는 한 여자가 치마에 서명을 해달라며 허벅지를 들어올렸다. 마침 옆에 있던 경찰이 참견했다. “존스턴 씨, 서명을 안 해도 됩니다.” 비프는 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정성스레 천천히 서명했다.
요즘 투어에서는 팬들에게 다가갈 친근한 캐릭터가 줄었다. 조던 스피스(이하 미국)는 모범생 같고, 장타자 더스틴 존슨은 운동에 빠진 괴물이다. 친근한 이웃 같은 캐릭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쇠고기’라는 별명을 가진 존스턴의 등장은 팬들에겐 가뭄 속 단비 같다. 타이거 우즈가 전성기일 때 그와 대척점에 있던 캐릭터가 존 댈리였다. 도저히 인간인 것 같지 않은 완벽한 프로선수 맞은편에는 티샷에 오비(OB·Out of Bounds)를 내고, 사고도 저지르면서 골프를 즐기는 평범한 이웃 같은 캐릭터가 필요하다. 댈리는 노래를 즐겨 부르며 음반도 냈고, 결혼도 너덧 번 했지만 인생을 밉지 않게 즐기는 모습에 인기가 많았다. 아쉬운 대목은 그가 올해부터 시니어 투어로 옮기면서 팬들도 덩달아 떨어져 나갔다는 점이다.
이런 댈리의 공백을 메울 캐릭터가 바로 존스턴이다. 그는 지난해 BMW PGA챔피언십에서 홀인원을 하고는 정신 나간 듯 티박스에서 뛰어다니고 갤러리에 있던 친구와 가슴을 맞부딪치면서 무슨 게임 쇼에 참가한 사람처럼 흥을 즐겼다. 프로선수 같지 않은 소박함을 지녀서인지, 댈리만큼 인기가 많다.
2010년 프로로 데뷔한 비프 존스턴은 유러피언투어 첫 승을 4월 스페인오픈에서 거뒀다. 다행히 내년 미국 PGA투어 시드를 획득해 조만간 큰물에서 놀게 됐다. 그는 서명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성적과 무관하게 어디서든 팬들과 교감하는 사내이니 언제 어디서든 서명을 받을 수 있다. 뭘 내밀어도 그는 즐겁게 서명한다. 요즘은 주인공보다 개성파 배우가 드라마를 더 빛낸다는 사실을 팬들이 알아주니 그도 기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