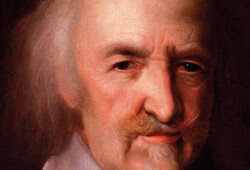미군 야전교범 ‘OPERATIONS(작전)’.
‘기습의 원칙’은 ‘손자병법’에도 등장한다. ‘전쟁의 승리는 기발함에서 온다’(凡戰者 以奇勝·제5편 ‘병세’)는 구절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현대 군사작전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기습은 ‘상대가 예상치 못한 시간, 장소, 방법으로 상대를 타격하는 것’이다. 통상 전투력의 균형을 바꾸는 게 기습의 목적이므로 흔히 전투력이 열세이거나 상황이 급박한 쪽이 시도하게 된다.
미군 야전교범 ‘OPERATIONS(작전)’ 역시 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유의사항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기습작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매우 강력하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조합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OPRATIONS’는 △템포의 변화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공격 △시기(timing)의 선정을 가장 큰 관건으로 제시한다.
시기와 장소의 주도권
상대가 이미 알고 있다 해도 미처 대응할 수 없게 하는 것 역시 기습에 속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템포의 변화다. 군사 작전에서 템포란 속도와 리듬의 복합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한 박자 느리게 움직이는 것도 템포를 이용하는 좋은 방법이다. 어두운 야간이나 방비가 취약한 새벽이 아니라, 상대가 밤을 지새우고 난 뒤 쉬고 있는 대낮에 공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적이 생각지 못한 곳을 공격해 성공을 거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인천상륙작전이다. 미국, 영국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과과정에도 포함돼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필자는 이 작전 기획에 참가한 에드워드 로니 장군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분석력과 직감, 뚝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맥아더 장군은 기획팀에게 상륙 지역을 선정해보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 전북 군산 근처를 지목했다. 그랬더니 장군은 ‘이 겁쟁이들, 이 정도는 돼야지’라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길게 화살표를 쓱 그렸다. 인천이었다. 우리는 모두 놀랐고 반대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첨단 감시장비가 발달한 현대 전장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기를 조정한 기습만으로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화, 자동화된 군대라도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다. 그 공백이나 허점을 노려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사적 결심수립절차(Military Decision Making Process)는 임무 분석부터 방책 선정까지 최소 30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지면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뇌에서 발까지 명령신호가 전달되는 데 수 초가 걸렸다는 공룡과 다르지 않다. 재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포유류는 이를 이용해 공룡을 공격했다. 아프가니스탄 민병대가 옛 소련과 미국에게 사용했던 전술도 같은 선상에 있다. 상대가 생각할 때 움직이고 상대가 움직일 때는 숨는 것이다.
비즈니스 현장에도 그야말로 괜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 멀쩡한 보고서를 10번 넘게 고치거나, 매번 똑같이 해오던 일인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다. 하루바삐 공고해야 하는 사안을 두고 위원회나 공청회를 열라든가, 중간결재권자로 검토만 하면 되는 간부가 내규를 가지고 와보라며 반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트집에는 ‘기습의 원칙’이 딱이다.
엉뚱한 질문은 엉뚱하지 않다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하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앉아 있는 사람).
대답 대신 질문을, 질문 대신 찌르기를 선택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상대가 미처 생각지 못한 질문을 던져서 흔든 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흥정의 기본이다. 일단 흔들리기 시작하면 훨씬 작은 힘으로도 상대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허브 코헨은 저서 ‘협상의 법칙’에서 150달러짜리 중고 냉장고의 가격을 깎기 위한 화법을 예로 든 적이 있다. ‘150달러란 말이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냉장고가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150달러에 당신에게 팔겠어요. 내 건 더 새것이에요.’ 일단 이렇게 흔들어놓고 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 ‘좋습니다. 까짓 거 50달러 깎아드리죠.’
협상 상대가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트집을 잡는다면 갑자기 질문을 던져보자. “그럼 당신은 우리 회사 감사팀이 모두 멍청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말을 건네보자. “만약 이게 남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손해 볼 건 없고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흔들리면 틈이 보이고 그 틈새에서 기회가 생긴다.
시기 조정으로 우위를 점하는 데는 무엇보다 상대에게 일을 망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친구가 사내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한 경험을 들려준 적이 있다. TF 팀장은 총무과에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 별명이 ‘서진’이었다. 붓글씨를 쓸 때 한지가 날아가지 않게 누르는 바로 그 서진이다. 토론하면 그 자리에 앉아 몇 시간, 보고서를 보여주면 책상 위에 놓고 몇 시간을 보내는 게 그의 업무방식이었다.
사내문화 혁신 TF는 특성상 회장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일이 잦았는데, ‘서진’이 마지막까지 보고서를 갖고 있다 보고 시간이 닥쳐서야 수정사항이 적힌 결재본을 내놓으니 미칠 지경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고친 부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님은 불문가지. 작은따옴표를 낫표로 바꾼다든지 조사를 넣고 빼는 정도였다. 시간이 촉박해 급하게 고치다 오·탈자가 나오거나 문서양식에 어긋나면 팀 전체가 욕을 먹어야 했다.
친구가 택한 방법은 최종본이 아닌 보고서를 미리 주고, 시간이 지나 보고 시간이 닥쳤을 때 최종본을 다시 갖다 주는 것이었다. 더 극단적인 방법도 있었다. 핵심 사안을 빼놓았다 팀장 결재를 받고 나면 집어넣는 것이었다.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때는 신중한 고려가 필수적이지만 시간의 중요성이 높은 업무라면 시도해봄직하다. 한 개인의 업무스타일 때문에 임무를 망쳐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