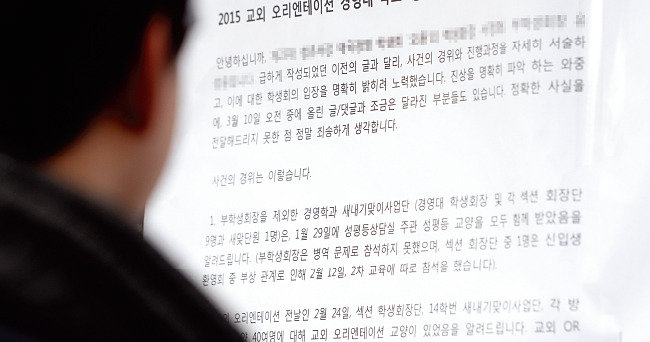
수도권지역 4년제 사립대 A교수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에 대해 얘기하다 이렇게 말했다. “교수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의 신입생 환영회와 엠티(MT), 동아리 행사 등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앞으로 대학 행사에서 가혹행위·성희롱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은 물론 담당교수까지 책임지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에 “학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이러한 내용이 시행되도록 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그렇잖아도 각종 ‘의무’에 몸살을 앓아온 대학교수 사회가 들끓고 있다.
“요즘 교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교육자로서의 꿈과 연구자로서의 삶만 포기한다면 대학교수도 나쁘지 않은 직업인 것 같다’고요. 사회 분위기가 점점 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영남지역 한 전문대 B교수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B교수는 교육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육자이자 연구자로 살고 싶어 대학교수가 됐다. 하지만 현재 그가 가장 힘을 기울이는 건 신입생 모집, 졸업생 취업 알선, 각종 프로젝트 수주다. 대학 입시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기가 되면 일주일에 나흘씩 학생 유치를 위해 뛰어다니고, 졸업 때가 되면 학생들을 직접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지역 내 기업체 등에 소개한다.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자주 이름을 올려야 학생 모집과 취업률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각종 행사 자문 등을 도맡는다.
B교수는 “4년제 대학 교수가 하는 일도 전문대 교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4년제 대학 비인기학과 교수보다 취업 잘되는 전문대 교수가 유리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강의 준비와 연구 실적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자 월급 떼서 연구실 운영비로?
교수들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대학이나 지역거점 국립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최근 교수가 논문 쓰는 걸 반기는 대학은 거의 없다. 입시 및 취업 관련 업무를 잘하고, 연구비를 많이 가져오는 교수가 인정받는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이 실적을 높이려고 사비를 쓰는 경우가 많고, 이는 법적 분쟁과 교수·학생 간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지방 사립대 C교수는 “교수 가운데 자신이 기업체에 소개해 취업한 제자의 월급 일부를 몇 달간 받는 이가 있다. ‘연구실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사실 아무 근거도 없다. 교수는 학생 모집과 취업에 들어간 사비를 그런 식으로 보전하는 거고, 학생들은 소개비인 셈 치는 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학생은 ‘교수가 돈을 받으려고 급도 안 되는 회사에 억지로 집어넣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이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교수들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취업률이 대학 평가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재임용이나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 많은 교수가 기업 인사담당자를 찾아다니며 학생을 취업시켜달라고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유무형의 접대도 곧잘 이뤄진다. 교수들은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고교 교사들에게 인사하는 경우도 많다. 상당수 지방대는 교수들의 출신 지역, 학교 등을 토대로 일종의 지역 할당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남지역 교수들이 호남지역까지 찾아다니며 학교 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에는 ‘찾아가는 입시설명회’가 유행하면서, 교수들이 학기 초부터 할당 지역 고교들에 연락해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개최를 요청하는 일도 생겼다. 한 교수는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는 ‘입시설명회를 요청해오는 곳이 있으면 교수들이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다’는 취지로 기획된 것이지만, 대부분 대학교수들이 해당 지역에 ‘초청해달라’고 부탁해 성사된다. 이것도 교수들의 실적이 되다 보니 교수들은 각 학교 입시 담당 교사들을 관리해 입시설명회 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서울권 대학들도 산간벽지는 물론 해외에까지 나가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교수들이 연구 시간 빼앗겨가며 학교 홍보대사 노릇을 하고 있지만, 불러주는 곳이 있으니 감사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다. 학과가 없어지면 정년 보장 교수도 당장 일자리가 사라지는 판인데 ‘하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까지 돌아간다.
대학원생들 “취직 때까지만 버티자”

문제는 이런 ‘수행’ 도중 교수나 외부 관계자가 성희롱, 성추행 같은 문제되는 행동을 해도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 또 다른 대학원생은 “교수가 외부 활동을 하면 대학원생도 일이 많아진다. 요새는 내가 대학원생인지 경리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요즘 상당수 대학원생이 학업과 조교 일 외에도 잡무에 시달리는데 ‘취직 때까지만 참자’고 버틴다”고 했다.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한국대학학회 회장)는 이에 대해 “대학들이 무한경쟁에 뛰어들고 교수 평가를 강조하면서 요즘 ‘교수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사라지고 있다. 연구자이자 지식인으로서 학문 후속 세대를 키우는 교수의 역할이 바로 서지 않으면 각종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