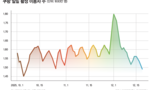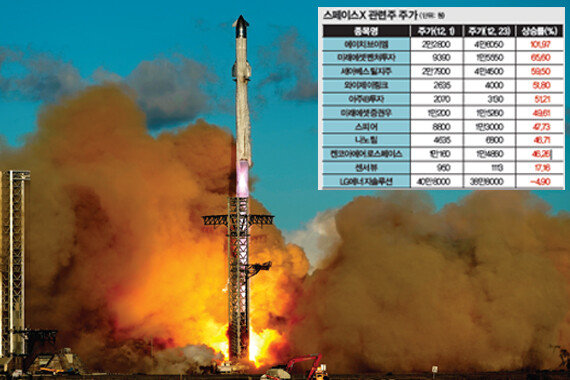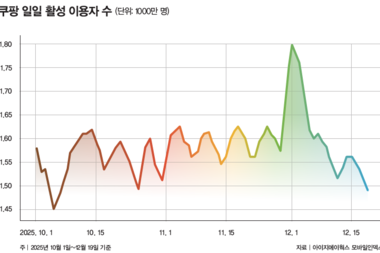하지만 속수무책으로 상표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상표권에 대한 회의감을 토로하는 이가 많다. 더욱이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후등록 상표권자의 상품이 대형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여전히 판매되기도 해 업계의 관심을 모은다.
2009년 A천연비누를 개발해 판매하던 사업가 K씨는 2015년 9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서’를 받았다. 2014년 10월부터 A천연비누와 동일한 상표의 비누를 판매 중이던 B사가 2015년 8월 특허법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소를 제기한 것. 그동안 B사는 3번에 걸쳐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K씨의 상표가 등록돼 있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급기야 소송을 낸 것이다. B사의 상품 판매를 중지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으로 B사를 방문한 K씨는 그 회사 대표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사죄의 뜻으로 매월 광고비와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하자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접었다. 이후 K씨는 B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B사가 제기한 소송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상표권 소송 중인데 물건 판매 여전?

문제는 상표권 소송을 진행 중인데도 B사가 여전히 A천연비누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B사의 자체 온라인 사이트는 물론, 일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원 상표권자가 항소해 상표권이 아직 소멸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물건을 판매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K씨는 상표권이 살아 있다는 전제하에 상대방에게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경고장을 보낸 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상표권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상표권 침해자에게 실상 부과되는 벌금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얘기다. K측 변리사는 “고의성과 판매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지긴 하지만 200만~300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시장에서 ‘짝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K씨가 상표권을 되찾을 경우 B사를 상대로 상표권 도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지만 그사이 상표권 도용자가 물건을 팔아 얻은 이익 전체에 대한 배상은 아닌 경우가 대다수다.
한편 특허청의 부정확한 심사 기준으로 상표권이 침해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줬다 나중에 특허심판원에 의해 등록무효 결정을 받는 경우인데, 그럼에도 상표가 취소된 자는 특허청을 상대로 그 어떤 손해배상도 물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카파(Kappa)’와 유사한 신발 브랜드인 ‘카파(KAPPA)’의 전용사용권 계약자인 F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사례를 들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탈리아 브랜드 카파(Kappa)는 카디건, 모자, 와이셔츠, 우산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반면, 국내 브랜드 카파의 지정상품은 신발로 해당 상품이 달랐던 데다 상표등록 심사 당시 카파(Kappa)가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인식된 저명한 상표라고 볼 수 없었던 만큼 특허청 판단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F사는 특허청의 과실로 중복상표로 등록됐다 결국 말소되면서 인수한 제품을 전량 폐기하는 등 손해를 입어야 했다.
작정하고 한국 상표 선등록하는 중국 브로커들
이에 대해 박준용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는 “상표나 특허 등을 등록하는 특허청의 실무상 심사 기준과 사법적 분쟁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달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허청은 심사 기준에 판례 반영목록 등을 별첨해 해당 경향을 실무에 반영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 역시 “특허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향후 심사관에게 책임이 전적으로 전가된다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상표법과 특허법에도 이러한 내용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국내 업체 간 상표권 분쟁도 분쟁이지만, 최근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늘면서 중국 내 브로커들에게 상표권을 침해당하는 일도 많아졌다. 악의적으로 수십, 수백 개의 한국 브랜드 상표권을 선(先)등록한 브로커들은 국내 상표권자가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자국 내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거액의 협상금을 요구해 상표권을 양수하도록 강요하는 수법이다. 특히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목인 화장품, 식품, 프랜차이즈 등에 집중돼 있다. 한류 대표 화장품인 ‘설화수’는 ‘설연수’, LG생활건강 ‘수려한’은 ‘수아한’, ‘네이처리퍼블릭’은 ‘네이처리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바리바게뜨’ 등 중국 현지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유사 상표로 등록됐다. 아예 동일 이름으로 등록돼 있던 ‘굽네치킨’은 중국 진출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국 상표권자에게 돈을 주고 다시 상표권을 사왔다. 똑같이 중국 진출을 꿈꿨던 ‘설빙’은 현재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를 노리는 상표 브로커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상표권 출원 건수는 2008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고 한국 기업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권은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인정된다. 기업 이미지와 영문 발음 등을 고려해 미리 중국어 브랜드를 만들고 이와 비슷한 브랜드까지 동시 등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