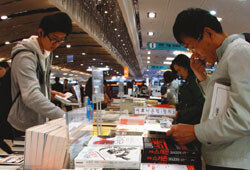그렇다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불기 시작한 ‘안철수 신드롬’의 원인은 무엇일까. 수많은 언론과 책에서 그 원인을 분석했다. 그중에서 정치 및 경제 전문가 네 사람의 분석을 짚어보자.
정치컨설턴트 박성민은 ‘정치의 몰락’(민음사)에서 “공공성과 소통을 결여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길항으로 등장했다”고 전제하면서, 대중은 안철수에게서 “사업가로서의 빌 게이츠와 혁신가로서의 스티브 잡스뿐 아니라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부자 워런 버핏의 이미지를 모두 본다. 조국 서울대 교수 같은 ‘강남 좌파’든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강남 우파’든 간에 문화적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상징하는 ‘강남성’은 이 시대에 닮고 싶은 동경의 대상인데, 안 교수가 바로 이런 강남성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정치학자인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칼럼 ‘안철수의 선택?’에서 안철수 신드롬이 생겨난 주요 원인을 ‘한국 정치에 대한 절망과 공익에 대한 갈구’ ‘김대중·노무현 정권, 나아가 이명박 정부 등 제도정치권이 모두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민생 해결에 실패함으로써 국민이 제3의 대안을 찾는 것’ ‘공감의 정치, 따뜻한 정치에 대한 갈구’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은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어크로스)에서 “‘기업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준 안철수는 당장 이익이나 주식 매각 차익을 챙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투명한 경영 프로세스를 갖추고 경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직하고 선한 의지를 가진 기업과 기업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재벌기업처럼 탐욕스러운 성공이 아니라, 적절한 범위에서의 상식적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위안을 얻은 것이 안철수 신드롬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은 ‘문제는 경제다’(웅진지식하우스)에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실패하다 보니 전 세대에 걸쳐 불안이 만성화하는 현실에서 정부와 정치권, 사법 시스템, 언론이 불안을 완화하기는커녕 거듭된 정책 실패와 기득권 집착 등으로 오히려 증폭시키는 것이 ‘안철수 바람’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한다.
4·11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것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국면에서 미래에 불안함을 느끼는 국민이 ‘국가와 민족’보다 ‘개인과 일상’을 중시하는 큰 흐름을 간파하지 못한 것, 달리 말하면 앞에서 네 사람이 지적한 ‘안철수 신드롬의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이명박 정권 심판만 부르짖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1958년 출생.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학교도서관저널’ ‘기획회의’ 등 발행. 저서 ‘출판마케팅 입문’ ‘열정시대’ ‘20대, 컨셉력에 목숨 걸어라’ ‘베스트셀러 30년’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