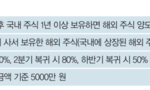19명의 형제가 있는 집안이 있다. 이들의 재산 상태는 천차만별이다. 맏이는 100억 원이 넘지만 어떤 형제는 한 푼 없이 빚만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형제는 씀씀이가 모두 같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괜찮겠지만 저축 없이 돈만 쓰는 사람은 금세 부채의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바로 유로존 19개 국가의 상황이 딱 이렇다. 맏이는 독일이고, 저축 없이 빚만 있는 나라가 그리스다. 맏이는 동생에게 이제라도 돈을 아껴 빚을 갚아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한번 커진 씀씀이는 줄이기 어려운 법. 씀씀이를 줄이라는 맏이의 요구에 동생의 입이 주먹만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1999년 세상에 등장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형편이 다른 나라들이 단일통화를 쓰다 보니 경제력과 환율이 어긋나버린 것이다.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 경험했던 것처럼 국가 부채 리스크가 커지면 통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올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이 오르자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달러가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그런데 그리스의 경우, 유로화로 묶여 있다 보니 통화 가치가 떨어질 일이 없다. 환율이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유로존의 태생적 한계
또 다른 문제는 통화와 재정의 분리다. 경제정책의 양대 축은 금리와 통화량 등을 조절하는 통화정책과 정부 돈을 쓰는 재정정책이다. 유로존은 통화는 통일돼 있으나 재정은 각 국가의 영역이다. ‘따로 또 같이’ 상황이다. 그런데 재정정책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바뀐다는 점이 문제다. 시장 친화적인 우파 정부냐, 아니면 그리스 시리자처럼 급진좌파 정권이냐에 따라 재정 운용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통화와 재정이 분리돼 있으면 일관된 경제정책 운용이 불가능하다.
조금은 후견지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리스 사태는 한 번쯤 일어날 일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불안한 동거가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시장이 꺼려하는 것은 사태의 해법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다.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이탈)든, 유로존 잔류든 가닥이 잡히면 시장은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리스 사태처럼 한 국가의 문제가 세계 시장 전체를 뒤흔든 예는 많지 않다. 특히 그리스 같은 자본주의 주변부 국가의 위기가 주는 파급력은 걱정만큼 크지 않다. 우리나라가 혹독한 외환위기를 겪는 동안에도 세계 경제는 성장했다. 1980년대 말 당시 세계 2위 경제 국가였던 일본이 버블 붕괴 후유증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도 글로벌 경제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90년대는 IT(정보기술) 같은 혁신의 시대였고, 자본주의의 또 다른 황금기였으며, 주식과 부동산은 대세 상승기였다. 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이후 배 째라는 식으로 버텼지만 세계 경제는 러시아 사태를 충분히 이겨냈다.
투자자들이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경제위기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위기 없는 성장은 현실 영역이 아닌, 동화와 상상 속 영역이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 못지않게 위기가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막는 방어 전략도 중요하다. 현실적으로는 개인투자자에게 방어 전략이 더 필요하다. 단 한 번의 위기로 삶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기에 대처하는 방어 전략으로 대략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저비용 구조의 삶이다. 경제가 성장해 소득이 늘면 고비용 구조의 삶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위기는 소득 단절 혹은 감소를 의미한다. 이때 고비용 구조에 익숙한 기업과 개인은 치명상을 입는다. 그리스는 전형적인 고비용 국가였다. 그리스 공무원은 독일 공무원보다 급여가 많았다. 그런데 세금은 더 적게 걷었다. 적게 벌고 많이 썼다. 이제 그리스는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 저비용 구조의 삶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은 저비용 구조를 장착한 기업이나 개인이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투자 일국주의 벗어나야
둘째, 투자에서 일국주의(一國主義)를 벗어나야 한다. 시계추를 거꾸로 돌려 1997년 말로 가보자. 당시 최고 수익률을 안겨준 금융상품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해외 펀드였다. 원달러 환율이 1800원대까지 치솟자 외환에서만 2배 이상 수익이 났다. 한 국가에 자산을 ‘몰빵’해놓으면 위기 때 위험하다. 쓰나미 같은 위기에서는 주식도, 부동산도 쓸려나가기 때문이다. 자산 간 분산보다 때로는 지역 간 분산이 더 중요하다.
셋째, 건전한 재정이다. 건전한 재정 없이 건전한 삶은 존재할 수 없다. 평생 돈에 쪼들리고 부채에 시달렸던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돈에 대해 이렇게 적은 바 있다. ‘돈은 주조된 자유다. 그래서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돈은 열 배나 더 소중한 것이다.’ 도스토옙스키와 달리 당대 최고 갑부 가운데 한 명이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는 ‘백만장자의 표시가 뭔지 아는가. 바로 수입이 항상 지출을 초과하는 것이다. 백만장자들은 일찍부터 저축을 시작한다’고 자서전에 적고 있다.
돈에 관해서는 정반대 삶을 살았던 두 거인(巨人)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의 중요성이다. 부채는 위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위기는 부채에 노출된 기업이나 개인을 먼저 사냥한다.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건전한 재정이 없으면 건전한 삶도, 자유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세계 경제가 커지고 통합되며, 기술 혁신으로 위기 전파 속도마저 과거보다 빨라지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간 본성이 그 속도만큼 진화하는 것은 아니고, 건전한 삶의 기초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건전한 재정과 잘 분산된 투자 포트폴리오는 예나 지금이나 건전한 경제적 삶의 기초다. 그리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1999년 세상에 등장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형편이 다른 나라들이 단일통화를 쓰다 보니 경제력과 환율이 어긋나버린 것이다.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 경험했던 것처럼 국가 부채 리스크가 커지면 통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올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이 오르자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달러가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그런데 그리스의 경우, 유로화로 묶여 있다 보니 통화 가치가 떨어질 일이 없다. 환율이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유로존의 태생적 한계
또 다른 문제는 통화와 재정의 분리다. 경제정책의 양대 축은 금리와 통화량 등을 조절하는 통화정책과 정부 돈을 쓰는 재정정책이다. 유로존은 통화는 통일돼 있으나 재정은 각 국가의 영역이다. ‘따로 또 같이’ 상황이다. 그런데 재정정책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바뀐다는 점이 문제다. 시장 친화적인 우파 정부냐, 아니면 그리스 시리자처럼 급진좌파 정권이냐에 따라 재정 운용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통화와 재정이 분리돼 있으면 일관된 경제정책 운용이 불가능하다.
조금은 후견지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리스 사태는 한 번쯤 일어날 일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불안한 동거가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시장이 꺼려하는 것은 사태의 해법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다.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이탈)든, 유로존 잔류든 가닥이 잡히면 시장은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리스 사태처럼 한 국가의 문제가 세계 시장 전체를 뒤흔든 예는 많지 않다. 특히 그리스 같은 자본주의 주변부 국가의 위기가 주는 파급력은 걱정만큼 크지 않다. 우리나라가 혹독한 외환위기를 겪는 동안에도 세계 경제는 성장했다. 1980년대 말 당시 세계 2위 경제 국가였던 일본이 버블 붕괴 후유증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도 글로벌 경제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90년대는 IT(정보기술) 같은 혁신의 시대였고, 자본주의의 또 다른 황금기였으며, 주식과 부동산은 대세 상승기였다. 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이후 배 째라는 식으로 버텼지만 세계 경제는 러시아 사태를 충분히 이겨냈다.
투자자들이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경제위기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위기 없는 성장은 현실 영역이 아닌, 동화와 상상 속 영역이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 못지않게 위기가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막는 방어 전략도 중요하다. 현실적으로는 개인투자자에게 방어 전략이 더 필요하다. 단 한 번의 위기로 삶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기에 대처하는 방어 전략으로 대략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저비용 구조의 삶이다. 경제가 성장해 소득이 늘면 고비용 구조의 삶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위기는 소득 단절 혹은 감소를 의미한다. 이때 고비용 구조에 익숙한 기업과 개인은 치명상을 입는다. 그리스는 전형적인 고비용 국가였다. 그리스 공무원은 독일 공무원보다 급여가 많았다. 그런데 세금은 더 적게 걷었다. 적게 벌고 많이 썼다. 이제 그리스는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 저비용 구조의 삶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은 저비용 구조를 장착한 기업이나 개인이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투자 일국주의 벗어나야
둘째, 투자에서 일국주의(一國主義)를 벗어나야 한다. 시계추를 거꾸로 돌려 1997년 말로 가보자. 당시 최고 수익률을 안겨준 금융상품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해외 펀드였다. 원달러 환율이 1800원대까지 치솟자 외환에서만 2배 이상 수익이 났다. 한 국가에 자산을 ‘몰빵’해놓으면 위기 때 위험하다. 쓰나미 같은 위기에서는 주식도, 부동산도 쓸려나가기 때문이다. 자산 간 분산보다 때로는 지역 간 분산이 더 중요하다.
셋째, 건전한 재정이다. 건전한 재정 없이 건전한 삶은 존재할 수 없다. 평생 돈에 쪼들리고 부채에 시달렸던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돈에 대해 이렇게 적은 바 있다. ‘돈은 주조된 자유다. 그래서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돈은 열 배나 더 소중한 것이다.’ 도스토옙스키와 달리 당대 최고 갑부 가운데 한 명이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는 ‘백만장자의 표시가 뭔지 아는가. 바로 수입이 항상 지출을 초과하는 것이다. 백만장자들은 일찍부터 저축을 시작한다’고 자서전에 적고 있다.
돈에 관해서는 정반대 삶을 살았던 두 거인(巨人)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의 중요성이다. 부채는 위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위기는 부채에 노출된 기업이나 개인을 먼저 사냥한다.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건전한 재정이 없으면 건전한 삶도, 자유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세계 경제가 커지고 통합되며, 기술 혁신으로 위기 전파 속도마저 과거보다 빨라지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간 본성이 그 속도만큼 진화하는 것은 아니고, 건전한 삶의 기초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건전한 재정과 잘 분산된 투자 포트폴리오는 예나 지금이나 건전한 경제적 삶의 기초다. 그리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