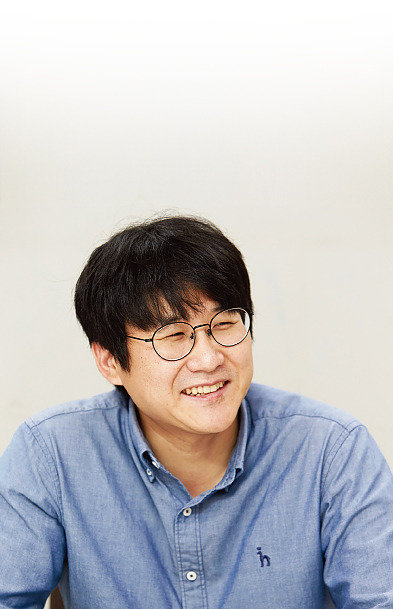
‘309동 1201호’는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수입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교와 시간강사로 수년간 몸담아온 대학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은행 대출을 받는 데도 실패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엔 직장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패스트푸드 업체에 취직해야 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새벽부터 아침 강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냉동냉장 건자재 상자’를 150여 개씩 실어 나르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한 명의 인간으로 이 사회에 속해 있음을 자각했다. 이는 언제부턴가 ‘지방시’(‘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의 줄임말)라는 이름으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옮겨지며 수백만 건 조회 수를 기록한 연작 글의 내용들이다. ‘309동 1201호’는 한 글에서 이렇게 썼다.
‘맥도날드는 나를 노동자로 대우해줬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임을 증명하는 우편물이 눈물겨웠다. 월급에서 꼬박 1만4000원이 빠져나갔는데, 그것으로 나는 처음으로 가족을 ‘피부양자’로 둘 수 있었다. 노동하는 한 인간에게 허락돼야 할 당연한 그 감각을 나는 대학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지방시’ 이후 만난 새로운 세계
이 새로운 감정이 ‘지방시’의 출발점이었다. 한 발 물러서 대학이라는 공간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당연시해온 그 안에서의 삶을 짚어보며, 평생 책상물림이던 대학원생이 자신의 성찰을 기록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그 글들이 제가 나중에 더 나은 연구자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김민섭’(사진)이라는 본명으로 세상과 마주하게 된 ‘지방시’ 저자가 한 말이다. 그러나 기대는 빗나갔다. 그의 글이 온라인 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같은 제목의 책으로 묶여 출간되면서 그의 이름과 그가 몸담은 학교가 세상에 알려진 탓이다. 김씨는 “나는 특정 학교, 특정 교수의 잘못을 고발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어느새 ‘내부고발자’가 된 대학원생이 설 자리는 남아 있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연구실에서 짐을 꾸렸고, 2008년 대학원 진학 이래 세계의 전부라 믿었던 공간을 떠나 ‘바람 부는 세상’에 서게 됐다. ‘향후 1년간 글만 쓰며 지내보자. 그것으로 생계가 꾸려진다면 그 후에도 죽 하고, 안 되면 무엇이든 새로운 일을 찾자’는 게 당시 그의 결심이었다고 한다. 아내도 적극 지지했다. 어린 시절 소설가를 꿈꿨고 국문학을 전공해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그에게 ‘글쓰기’는 늘 마음 한 곳에 넣어뒀던 바람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같은 이유로 패스트푸드점 일도 그만뒀다고 했다. 다행히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는 퇴직 후에도 2년간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주게 돼 있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후 정말 한동안 글만 썼어요. 몇몇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개인적인 글도 썼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멍하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전보다 훨씬 긴 시간을 쏟는데도 글이 잘 써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문득 내가 보는 세상이 대학원생 시절 보던 세상보다 더 줄어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씨의 말이다. 그는 “대학 연구실에 앉으면 책상과 거기 꽂힌 책만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내가 패스트푸드점에 가서야 대학의 실상을 알게 된 것도 그 때문”이라며 “그곳에서 ‘책을 덮고 일어나야만 비로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연구실을 떠난 뒤 집에 들어앉으면서 내가 다시 나를 책상 앞에 가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마침 원고료 수입만으로 생활을 꾸리는 것도 힘에 부치기 시작한 때였다. 아내는 만류했지만 ‘가족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대학원 시절 많은 선후배가 자조적으로 읊조리던 한 문장이 떠올랐다고 한다. ‘할 일 없으면 대리운전이나 해야지’ 하는 목소리였다. 그때 김씨를 짓눌렀던 ‘세상살이의 고단함’에 대한 기억 너머로 ‘대리’라는 단어가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저는 그때까지 대학원에 다닌 8년 동안의 제 삶을 ‘유령의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학에 분명 존재했지만 고용한 사람도, 근로계약서도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시간을 ‘대리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규칙, 다른 사람의 욕망에 저를 맞춰가며, 말 그대로 ‘대리’해 살아왔을 뿐이라는 깨달음이 온 거죠. 주체성을 가진 개인으로서 세상을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맥도날드에 취업하기 전까지는 대학에서 온갖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걸 보지 못했고, 남들처럼 ‘대학 밖에 나가면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여겼어요. 대학을 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자신도 그 안에서 괴물이 돼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타인의 운전석

현재 김씨는 ‘카카오드라이버’에 등록한 대리기사다.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일하며 ‘지방시’를 썼던 바로 그때처럼, 자신이 만나는 세계의 풍경과 그 안에서 얻은 성찰을 기록하는 르포르타주 작가이기도 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 ‘대리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연재하기 시작한 그는 ‘타인의 운전석’을 “노동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취재의 장이고, 대학 연구실 밖에서 찾아낸 학문의 공간”이라고 정의했다. 1t 트럭부터 최고가 수입차까지 다양한 차량을 몰고, 풋풋한 20대 연인부터 중년의 불륜 커플까지 수많은 이의 욕망을 실어 나르며, 그리고 끝내는 뜬눈으로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를 향해 막차가 끊긴 도시의 밤 거리를 숨 가쁘게 달음박질치는 동안에도, 그는 세상을 느끼고 자신을 성찰하며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 안에서 그가 오랜 세월 꿈꾸던 살아 숨 쉬는 글이 쏟아지고, 가족과 따뜻한 밥을 나눌 수 있는 돈도 나온다. 김씨는 이 체험을 묶어 10월쯤 두 번째 책을 펴낼 계획이다. 그는 “운전대를 잡으며 내게 정말 필요한 건 노동의 공간이라는 걸 알았다. 대학보다 더 좋은 강의실, 연구실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앞으로도 계속 현장과 책상을 오가는 르포르타주 작가로 살아가며, 그것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싶다”고 밝혔다.













![[영상] “내년 서울 집값 우상향… <br>세금 중과 카드 나와도 하락 없다”](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48/a8/ac/6948a8ac1ee8a0a0a0a.png)


![[영상] “우리 인구의 20% 차지하는 70년대생, <br>은퇴 준비 발등의 불”](https://dimg.donga.com/a/380/253/95/1/carriage/MAGAZINE/images/weekly_main_top/6949de1604b5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