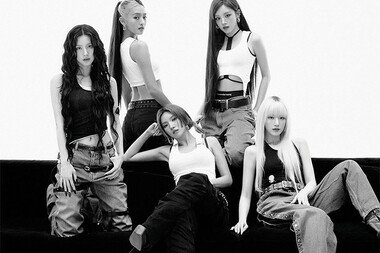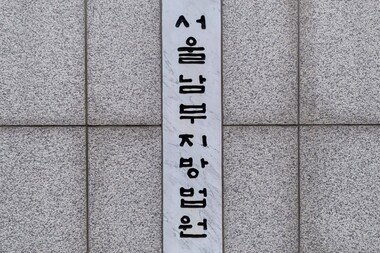3단으로 구성된 시모르그 로켓은 노동미사일급 엔진 4기를 묶어 1단 추진체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로켓과 인공위성 제작을 통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북한은 2월 7일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탑재한 로켓을 발사해 지구 저궤도 500km 지점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과 이란이 나흘 만에 잇따라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는 것은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광명성 4호보다 3배 더 강한 추진력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커넥션을 추적해온 제프리 루이스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 연구원은 “북한이 이란과 기술 협력으로 80tf 로켓을 개발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보당국도 북한이 이란의 협력으로 신형 로켓을 개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뉴욕타임스’ 9월 26일자 보도). 이 때문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월 이란 군수업체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의 임원 2명과 이란 군병참방위부(MODAFL)의 간부 1명을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렸다. SHIG의 무역 담당 임원인 사예드 자바드 무사비는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직원들과 직접 협력해왔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미국과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업체다. 해외자산통제국은 SHIG가 액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과 로켓 추진체의 지상시험에 쓰는 밸브, 전자장비, 측정장비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통해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또한 SHIG의 임원 세예드 미라흐마드 누신과 MODAFL의 부책임자인 사예드 메흐디 파라히가 북한의 80tf급 로켓 엔진 개발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했다고 밝혔다.
신형 엔진은 Super ICBM?

그렇다면 북한이 이란과 언제부터 신형 로켓 개발을 추진해왔을까. 미국 정보당국은 3년 전부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은 2013년 11월 26일과 27일 ‘북한이 신형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 이란 기술자가 대거 북한을 방문했다’면서, 미국 정보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신형 로켓 엔진의 추력은 80tf’라고 보도했다. 당시 이 매체는 이란의 액체연료 추진 로켓 개발을 담당하는 SHIG의 기술자들이 비밀리에 2013년 9월까지 여러 번 평양을 방문했으며 북한이 개발 중인 80tf급 로켓 엔진을 살펴봤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한 ‘신형 엔진은 Super ICBM’이라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만든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과 이란 모두 앞으로 핵탄두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그런데 북한이 신형 로켓을 개발하고 이란 기술자들이 방북해 협력하던 그때 마침 스위스 제네바에선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북한의 80tf급 신형 로켓 엔진 개발 사실을 담은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버락 오바마 정부가 제네바 회의에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란과의 핵협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앞으로 신형 로켓 엔진을 KN-08이나 KN-14 미사일에 탑재해 ICBM 발사시험에 나설 개연성이 높다.
이란은 4월 19일 북한의 신형 로켓 엔진분출시험에 앞서 신형 엔진을 장착한 로켓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4월 21일 ‘이란이 비밀 미사일 기지에서 시모르그 로켓을 시험 발사했으며, 이 로켓은 북한에서 수입한 기술로 만들었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 내용으로 볼 때 이란은 북한을 대신해 신형 엔진을 장착한 로켓을 시험발사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루이스 연구원은 “북한의 신형 로켓 엔진은 이란과 공동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정도 크기의 로켓 엔진은 이란의 역량까지 기술이 향상됐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멜리사 핸햄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신형 로켓 엔진은 이란의 핵협상에 큰 걸림돌이 됐던 80tf급 추진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핸햄 선임연구원은 또한 “북한의 신형 로켓 엔진은 KN-08이나 그 개량형인 KN-14의 제1단 추진체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과 이란은 우주 탐사를 명분 삼아 ICBM을 공동개발해온, 이른바 ‘궤도의 축(Axis of Orbit)’일 개연성이 높다.
북한의 SLBM 성공은 이란의 세질 탄도미사일 기술 도입 때문?

북한이 그동안 개발해온 스커드, 노동, 대포동 1·2호, 은하 3호, 광명성 4호 등 주요 미사일과 로켓은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개발한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 미사일은 사거리 120~140km의 KN-02밖에 없다. KN-02는 1975년 옛 소련의 SS-21을 모방해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와 달리 한 번 점화되면 제어가 쉽지 않아 엔진을 제작하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KN-02의 고체연료 엔진은 사거리나 출력 등을 감안할 때 SLBM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해 3차례(5월 8일, 11월 28일, 12월 21일) SLBM을 시험발사했는데 당시 모두 액체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고체연료 엔진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3월 24일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의 지상 분출과 단(段)분리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어 4월 23일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SLBM을 시험발사했고 이 미사일은 30km를 날아갔다. 북한은 7월 9일 SLBM을 시험발사했지만 10여km 고도에서 공중 폭발했다. 두 차례 실패를 거쳐 고체연료 엔진을 공개한 지 4개월 만에 SLBM이 500km를 비행한 것은 외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반입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성과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탈 인바르 이스라엘 피셔항공우주전략연구소 우주연구센터장이 4월 19일 미국 하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인바르 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이란과 공유되고 있다”면서 “북한 고체연료 엔진의 지름이 1.25m라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란 탄도미사일인 세질과 제원이 같다”고 밝혔다. 사거리 2000~2400km인 세질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2단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다. 인바르 센터장은 “북한이 세질의 기술을 받아들여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부품과 설계도면, 기술 등을 도입해 미사일을 개발해왔지만 수년 전부터 북한보다 성능이 우수한 미사일을 제작해왔다. 특히 이란은 고체연료 엔진 분야에선 북한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일 전문가는 대부분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지 루빈 전 이스라엘 미사일방어국장도 “과거 북한이 세질 미사일처럼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을 보유한 적은 없다”면서 “북한이 이란으로부터 세질 미사일 기술을 도입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은 2008년과 2009년 세질 1호, 2호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현재 세질 2호를 실전배치해놓았다. 어쨌든 북한 SLBM은 자칫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커넥션을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