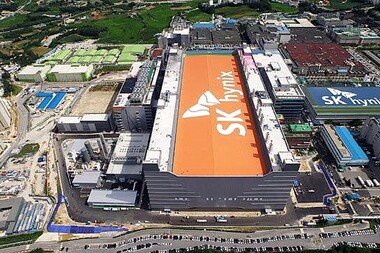‘부민옥’은 양무침, 추어탕, 부산찜(생선찜) 같은 다양한 음식을 파는 한국식 식당의 모습과 맛을 간직하고 있지만, 특히 육개장은 간판 메뉴로 손색이 없다. 국물 간이 조금 센 편이다. 이제는 노년에 접어든 이 집 단골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밥과 함께 먹으면 간이 딱 맞는다. 길게 썬 대파와 손으로 죽죽 찢은 고기가 특히 인상적이다. 손으로 찢은 고기는 국물을 더 많이 흡수한다. 칼로 자른 고기와는 식감도 다르다. 은근한 감칠맛이 맑은 국물에서 뿜어 나온다.
대구 육개장에 비해 단맛이 덜 나는 게 ‘부민옥’ 육개장의 특징 중 하나다. 단맛과 매운맛이 조화를 이룬 대구 육개장과 달리 이 집 육개장은 짠맛과 매운맛이 국물 속에 배어 있다. 탄산이 배인 아삭한 배추김치와 잘 어울린다. 새롭고 세련된 한식 식당이 속속 등장하지만 ‘부민옥’처럼 원형을 보존한 식당이 살아 있어야 새로운 시도들이 좌표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SK행복나눔재단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 ‘오늘’에서도 육개장을 판다. 외국 대사관들이 몰려 있는 용산구 동빙고동 한편에 자리 잡은 ‘오늘’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정교한 조리법, 조화로운 식기와 정겨운 서비스 등 흠잡을 데 없는 식당이다.

용산구 삼각지 근처에 있는 ‘문배동 육칼’은 육개장=밥이라는 공식을 깨고 성공한 식당이다. 달고 맵고 맑고 깊은 국물에 호박과 함께 삶아낸 넓고 진득한 면발을 넣어 먹거나 밥을 함께 먹는다. 면발의 탄력이나 삶은 정도도 좋고 국물도 균형이 잘 맞는다. 심심한 반찬은 센 육개장을 보완해준다.
‘부민옥’과 ‘오늘’에서 육개장을 맛보며 한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봤다. 서울 사람은 음식을 단품으로 보지 않고 여러 음식의 조화를 중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식(韓食)이라는 말은 대한제국시대 일식(日食)과 중식(中食)의 상대 개념으로 처음 등장했다. 일본은 막부라는 독특한 이중구조 덕에 에도(도쿄)와 오사카에서 외식이 발달했다. 상업이 성행한 중국도 외식문화가 꽃피었지만 농업 중심의 조선은 19세기 이전 외식문화가 미미했다. 밥을 잘 먹기 위한 음식들이 외식문화의 첫 장을 장식한다. 설렁탕과 국밥, 육개장이 외식문화의 창세기를 선도한 음식들이다. ‘부민옥’의 원형과 ‘오늘’의 세련됨은 한식의 저력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