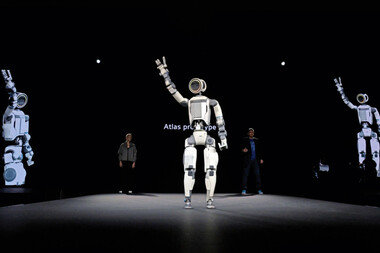지난해 9월 한국 해병대 장병들이 한미연합 상륙 훈련에 나섰다. 뉴스1
트럼프 지원에 힘입은 ‘포스 디자인 2030’
한국 해병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미국 해병대도 함상 백병전과 군함 경비 임무를 위해 창설됐다. 미 해병대는 독립전쟁이 시작된 해인 1775년 11월 10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 선술집에서 결성됐다고 한다. 최초 해병대 장교이자 초대 사령관으로 알려진 새뮤얼 니콜라스 대위는 해병대 결성 당시 그 선술집 주인이었다. 제2차 대륙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해병대 창설 결의문에는 “훌륭한 뱃사람이거나 바다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해병대 직위에 임명되거나 입대할 수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초기 해병대원은 대부분 필라델피아 항구를 거점으로 활동한 해운 종사자였다. 미 해병대 첫 근무지는 대륙해군 소유 군함이던 앨프리드호였다. 이들에게 주어진 기본 임무는 함상 백병전과 장교 경호, 정박 중 군함 및 주둔지 경비였다. 1776년 첫 기습 상륙작전에 성공한 미 해병대는 상륙과 해안경비 작전 전문 조직으로 본격적인 확장의 길을 걷게 된다.오늘날 미 해병대는 대검(帶劍)부터 핵폭탄까지 보유한 육해공 종합 전투부대로 성장했다. 이런 미 해병대가 최근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 상륙전보다 대해상(對海上) 작전을 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대대적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해상 전투가 핵심 임무였던 창설 당시 ‘초심’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20년 데이비드 버거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주도한 ‘포스 디자인 2030’ 구상에 따른 것이다. 해외 원정·상륙작전에 초점을 맞춘 기존 해병대 부대 구조와 장비를 대(對)중국 해상 전투 중심으로 바꾸는 게 뼈대다. 포스 디자인 구상은 해병대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지나치게 중국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전차와 포병을 없애면 상륙·지상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중국 봉쇄에 진심인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 속에서 과감하게 추진됐다.
포스 디자인에 따라 우선 미 해병대 전차부대가 모두 해체됐다. 미 해병대는 예하에 각각 2~4개 중대 규모의 M1A1 전차를 운용하는 전차대대 3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부대가 포스 디자인 발표 넉 달 만에 모두 사라졌다. 곡사포를 운용하던 21개 포대는 유럽·대서양 방면 5곳을 제외하고 모두 해체됐다.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공병대대도 곧 해체됐다. 또한 지상기동부대를 지원하는 AH-1Z·UH-1Y 전력도 대폭 감축됐다. 이들 전력과 함께 공중 화력 지원을 맡는 해병전투공격비행대의 표준 항공기 편제는 16대에서 10대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10월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산둥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첫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태평양 주둔 美 해병대 급진적 개편
이런 개편 움직임은 태평양 지역에서 먼저 이뤄졌다. 미 해병대는 태평양해병대를 구성하는 제1·3해병원정군과 해병대사령부 직할 기동부대인 제2해병원정군, 예비사단인 제4해병사단과 기타 직할대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게 서태평양을 담당하는 제3해병원정군이다. 일본 오키나와 캠프 코트니에 사령부를 둔 제3해병원정군은 제3해병사단을 중심으로 제1해병항공단, 제3해병군수단과 공지합동태스크포스(TF)로서 운용되는 신속기동부대인 제31해병원정대(MEU)로 구성됐다. 여기서 유사시 한미연합해병구성군의 핵심 전력으로 증원되는 제3해병사단의 해병연대가 최근 3년간 모두 해병연안연대(MLR)로 개편됐거나 개편을 앞두고 있다. 원래 제3해병사단은 예하에 3개 해병연대를 뒀다. 각 해병연대는 병력 1000명으로 이뤄진 해병대대 3~4개로 구성됐다. 최근 개편으로 제3해병사단 예하 해병연대 3개 중 2개(3·12연대)는 해병연안연대로 전환돼 예하 해병대대가 모두 사라졌다. 유일하게 남은 제4해병연대는 예하 대대 없이 제1해병사단에서 순환 배치되는 2개 대대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이 부대도 3·12연대와 마찬가지로 해병연안연대로 개편될 예정이다.
미국의 해군·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시스템(NMESIS). 미국 해군 제공
美 해군, 中 견제 위해 상륙함 운용 개념 수정
유사시 해병연안연대의 임무는 해군 상륙함 전력과 공조해 중국 군함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분쟁이 생길 경우 신속하게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일대에 배치된다. 대중(對中) 견제 차원에서 미 해군은 상륙함 운용 개념을 수정하고 있다. 원래 미 해군은 상륙준비전단(ARG)이라는 것을 운용했다. 항공모함(항모)처럼 생긴 개방 갑판형 강습상륙함 1척에 상륙수송선거함(LPD) 또는 상륙선거함(LSD) 2~3척이 함께 움직이는 개념의 부대다. ARG를 구성하는 상륙함에 해병원정대 병력과 장비를 나눠 적재하고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게 전통적인 운용 개념이었다. 하지만 향후 미 해군 상륙함은 유사시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미 와스프·아메리카급 같은 강습상륙함은 F-35B 운용 등 항모 전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들 강습상륙함에서 운용되던 상륙지원용 헬기와 틸트로터는 이제 샌안토니오급 LPD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다. 미국은 23척의 상륙수송선거함에 매클렁급(McClung-class)으로 명명된 4000t급 중형 상륙함 18~35척을 도입해 상륙 전력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강습상륙함 9척, 상륙수송선거함 및 상륙선거함 20척 중심으로 구성된 상륙함대에서 상륙선거함 9척을 퇴역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해군 F-35B 전투기가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 ‘트리폴리’에 착륙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
한국 해군의 상륙함 전력은 1개 상륙사단을 보유한 해병대 규모에 맞지 않게 초라하다. 각각 대형수송함(LPH) 독도급 2척과 초수평선 상륙작전 능력이 제한되는 ‘무늬만 신형 상륙함’ 천왕봉급 4척,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개념에서 별 발전이 없는 고준봉급 4척, 소형 상륙정 14척 등이다. 독도급은 개념 연구 단계에서 복층 격납고를 고려하지 않은 탓에 배수량에 비해 항공기·차량 탑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독도급 2척을 동원하면 3개 대대 규모 병력을 실을 수 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람’만 실었을 때 얘기로 보인다. 척당 병력 300명과 차량 26대 정도를 싣는 천왕봉급 4척, 병력 230명과 차량 10대 안팎을 싣는 고준봉급 4척이 모두 출동한다고 해도 해병대 제1사단의 1개 여단에 해당하는 병력과 지원 전력을 겨우 상륙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 해병대는 전시에 증원되는 미 해병 항공 전력의 축소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해병 항공 전력은 중형기동헬기 MUH-1 마린온 30대와 상륙공격헬기 MAH 24대가 전부다. MAH의 경우 낡은 개념의 상륙공격헬기인데 해병대와 전문가들 반대에도 도입돼 우려를 낳는다. 북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밀도 저고도 방공망을 갖췄다. 유사시 상륙부대 생존율과 작전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강력한 공중 화력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해병 항공 전력 강화에는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유사시 한국군이 상륙할 수 있는 후방 지역 도마다 군단 규모의 정규군을 하나씩 배치해놓았다. 미국이 대규모 상륙함 전력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군 독자 능력으로는 경보병 수준의 해병대 4000여 명만 상륙시킬 수 있다. 해병대의 기갑·화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전시에 이들 병력은 적지에 고립된 채 사투를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