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버드 야드의 평화로운 광경.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 교육·문화도시로 꼽히는 보스턴에는 하버드대,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 보스턴대 등 명문대가 많다. 그중 하버드대는 건국 시점보다 153년 앞선 1636년 세워진 미국 최초의 대학이다.
시내 중심부인 챈들러 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15분쯤 달렸을까. 보스턴을 동서로 가르는 찰스강이 보인다. 검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찰스강은 한강보다 작고 프랑스 파리 센강보다는 커 보인다. 찰스강을 가로지르는 하버드 다리를 건너 5분쯤 지나자 상상 속의 하버드대가 눈앞에 나타났다.
말로만 듣던 세계 최고 명문대. 하지만 첫 인상은 시시하다 싶을 정도로 평범했다. 무엇보다 교정이 작다. 서울대보다 훨씬 작은 느낌이다(메인 캠퍼스보다 2배 가까이 큰 올스턴 캠퍼스가 보스턴 외곽에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다). 오래된 건물이 많고 잔디밭도 자그마하다. 그러나 하버드대의 매력에 빠지는 데는 채 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점심식사 후 캠퍼스를 둘러보면서 전통이 풍기는 퀴퀴한 향기에 취한 기자는 이 대학의 매력을 ‘평범함 속 위대함’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역사 창출 열정과 사명감
취재 대상인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에 대한 느낌도 비슷했다. 교수진도 빈약하고 사무실도 보잘것없었지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열정과 사명감이 가득했다. 이국땅에서 맡는 한국 인문학의 향기는 상큼하고도 달콤했다.
“조선시대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다. 지역 간 차이점과 공통점이 언제 어떻게 형성됐는지 연구한다. 또 조선시대 제도와 문화를 중국 명·청과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인터뷰에 응한 중국인 여학생 차이의 말이다. 또랑또랑 빛나는 눈동자가 인상적인 차이는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박사과정 1년 차다.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엔 차이처럼 박사과정 학생이 15명, 석사과정 학생이 8명 있다. 학부에서 한국학 강의를 듣는 학생은 100여 명인데 대부분 미국인이다.
하버드대에 한국학연구소가 세워진 것은 1981년. 하버드대 동아시아연구소 페어뱅크센터의 후원을 받아서였다. 초대 소장은 미국 내 한국학 연구 선구자로 통하는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 와그너 교수는 93년까지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학연구소의 기틀을 다졌다. 58년 하버드대에서 처음 한국학(한국사) 강의를 한 사람도 와그너 교수였다.

한국학연구소 3대 소장인 맥켄 교수(왼쪽)와 2011년 4대 소장에 취임한 김선주 교수.
김 소장은 하버드대 한국학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버드의 이름값이 갖는 상징성이 있다. 학교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중요하다. 연구자나 연구소가 없는 한국학은 의미가 없다. 아직 규모가 작고 연구자도 적지만 조금씩 목소리를 높이려 한다.”
한국학연구소 소속 교수는 4명. 역사 분야 2명, 문학 1명, 인류학 1명이다. 역사는 에커트 교수와 김 소장이, 문학은 맥켄 교수가 강의한다. 인류학은 니콜라스 하크니스 교수의 전공이다. 연구소 행정직원 4명이 학사일정을 돕는다.
이 같은 규모는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것이다. 하버드대에서 중국학을 연구하는 교수는 70여 명, 일본학 교수는 40여 명에 이른다. 중국학 연구는 페어뱅크연구소, 일본학은 라이샤워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한국학연구소는 두 연구소와 같은 건물에 있다.
한국학연구소는 중국학이나 일본학 연구소에 비해 재정구조도 취약하다. 대학 당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외부 기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에커트 교수는 SBS문화재단, 멕켄 교수와 하크니스 교수는 KF(Korea Foundation·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을 받아 강의와 연구를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국력 차이다. 중국학, 일본학 연구는 19세기부터 진행했다. 반면 한국학 역사는 50년밖에 안 된다. 그간 한국학을 연구하면 직업을 보장받지 못했다. 박사 학위를 받아도 대부분 다른 일을 해야 했다. 오늘날 이 정도로나마 성장한 데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도움이 컸다.”
싸이 강연에 학생 800명 몰려

한국학연구소가 있는 하버드대 정부국제학센터(Center for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Studies·CGIS).
김 소장 취임 후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는 정착 단계에서 발전 단계로 접어든 양상이다. 먼저 한국미술사 강좌를 신설했다. 지난해 2월 개최한 한국미술사 워크숍 때는 초청받지 않은 연구자들까지 자비로 비행기를 타고 와 참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 한국미술 전시회도 열었다. 그림을 비롯해 영화 포스터, 사진, 국보 등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영화 강의도 개설했는데 반응이 좋다. 강사는 방문교수인 데이비드 정. 소수 세미나 형태로 진행하며 매주 영화를 보고 토론한다. 한국의 유명 영화감독을 초빙해 강연을 듣고 그의 영화를 상영하는 이벤트는 미국 학생들에게 대단한 인기다. 올봄에는 이장훈 감독이 방문했는데, 이 감독의 영화는 사흘간 3편 상영됐다. 그에 앞서 초청했던 임권택, 봉준호 감독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싸이의 하버드대 강연도 한국학연구소가 주관한 행사다. 5월 9일 하버드대 메모리얼교회에서 열린 이 강연에는 학생 8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김 소장은 “한류 열풍 덕을 본다”고 말했다.
“한류 영향으로 한국학 연구자가 증가하는 걸 5~6년 전부터 체감한다. 많은 미국인 학생이 케이팝(K-pop)을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는다. 이들 중 상당수가 우리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한국영화 이벤트에 참석한다. 최근엔 싸이 영향이 정말 컸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삼성과 LG의 전자제품이 인기를 끄는 것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강좌도 계속 늘려 가을학기부터는 사회학 교수가 합류한다. 앞으로 한국 정치학과 종교학 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연세대 사학과 80학번인 김 소장은 졸업 직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했다. 1986년 한국학 연구에 뛰어들어 제임스 팔레 교수 밑에서 12년 동안 석·박사과정을 공부했다. 박사과정 때는 연방정부로부터 5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 생계를 위해 통역, 세탁소 잡일, 청소 등 안 해본 일이 없다. 박사논문은 ‘홍경래의 난 연구’다.
한국학연구소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까. 문학을 강의하는 멕켄 교수는 7년간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1944년생이니 올해 한국 나이로 70세다. 62년 평화봉사단으로 방한한 것이 계기가 돼 한국학 연구를 시작했다. 73~74년 와그너 교수 추천으로 고려대에서 한국 시와 시조, 가사를 공부했다. ‘문학은 역사로 배워야 한다’는 지론을 가진 그는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한국 역사를 배웠다.
“‘삼국유사’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있다. ‘처용’의 춤과 노래가 그렇다. 역신의 등장은 세계화를 뜻한다. 어쩌면 처용이 외국 사람일지 모른다. 용왕이 ‘수로부인’을 잡아간다는 설화도 세계화와 통한다. 싸이 현상의 원형인 셈이다.”
“나 보기가 역겨워…”
멕켄 교수가 갑자기 “청산~” 하면서 큰 목소리로 시조를 읊었다. “디스 이즈 시조”라는 장난스러운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어 “물 아래 그림자 지니/ 다리 위에 중이 간다”로 시작하는 정철의 시조를 나직이 읊조린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김소월이다. “나 보기가 역겨워…” 하면서 ‘진달래꽃’을 흥얼거린다. “시 속에 춤이 있다”며 일어나서 율동을 한다. “참 좋다!” 하고 추임새를 넣으면서. 서정주, 고은, 박재삼, 김지하, 김남조도 그가 좋아하는 시인이다. 그는 이들을 대부분 직접 만났으며 대표시를 영역해 미국에 소개했다. 그가 펴낸 ‘Writing Asian Poetry(아시아 시작법)’에는 한국시뿐 아니라 중국 이백과 두보의 시, 일본 하이쿠 등이 실렸다. ‘Survey of Korean Literature(한국문학 개설)’은 ‘삼국유사’부터 현대시인 김혜순의 시까지 담고 있다. 그는 남의 시를 즐기고 소개하는 것에 성에 안 찼는지 ‘Urban Temple(도심의 절간)’이라는 자작시집까지 출간했다.

한국학연구소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디마(왼쪽)와 차이.

한국고대사연구실이 펴낸 서적들.
“한국인 교수가 가르치면 시 자체에만 집중한다. 미국인이 가르치면 문학을 넘어 문화를 알게 된다. 시뿐 아니라 역사, 음악을 다 배운다. 한국문학을 세계화하려면 책만 소개해서는 안 된다.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시 낭송회도 하고 문학저널에 영어로 번역해 실어야 한다.”
학생들의 얘기를 듣고 싶었다. 한국학연구소 측은 박사과정에 있는 외국인 학생 디마와 차이를 추천했다. 1981년생인 디마는 러시아인으로 모스크바 국제관계대에서 한국학을 접했다. 현재 박사논문을 준비 중이다. 88년생인 차이는 중국인으로 베이징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한국의 정치·경제·역사를 배웠다. 올해 박사과정에 진입했다.
디마는 북한통이다. 북한 김일성대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다. 이후 한국에 유학해 한국외대와 연세대에서 수업했다. 그가 쓰는 박사논문 주제는 ‘북한의 웃음과 코미디 역사’. 앞으로 북한학 권위자가 되고 싶다는 그는 남북한 대치상황에 대해 “북과 남은 따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한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했다.
“북이 왼손이라면 남은 오른손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국제관계 속에서 서로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깊은 관계를 생각지 않으면 위기가 계속될 것이다. 오늘날 이데올로기와 제도가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같은 문자와 역사를 가진 한 민족 아닌가.”
차이의 꿈은 외교관이었다. 하지만 한국을 알게 되면서 진로가 바뀌었다. 계기는 2006년 중국에서 접한 한국 드라마 ‘대장금’. 한국 전통문화를 알게 되면서 한국은 그의 머릿속에 ‘예의 바른 나라’ ‘중국과 깊은 관계를 가진 중요한 이웃나라’로 각인됐다.
차이는 2008년 교환학생으로 경희대에서 1학기 동안 공부하며 한국인 친구도 사귀었다. 석사과정에서 한국 역사를 전공한 차이가 구상한 박사논문 주제는 조선시대와 중국 명·청시대 문화 및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김선주 소장으로부터 지도를 받는다. 차이는 졸업 후 한국학 관련 저술활동을 하면서 교수나 학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기회가 되면 한국 대학 강단에도 서고 싶어 한다.
한국학연구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한국고대사연구실(Early Korea Project)이다. 삼한시대와 가야, 삼국시대 등의 역사 및 고고학을 연구하는 곳이다. 그간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State and Society in Middle and Late Silla(중·후기 신라시대 국가와 사회)’ 등 영문 서적 4권을 펴냈다.
한국고대사연구실을 이끄는 마크 바잉턴 교수는 1983년 주한미군으로 대구 공군기지에서 복무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어릴 때부터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연세대 어학당에서 한글을 배우고 한문을 독학하며 한국 고대사 연구의 발판을 다졌다. 94년 대학원에서 고구려사를 전공한 후 20년간 한국 고대사를 파고들었다.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후원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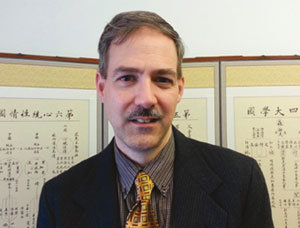
한국고대사연구실 마크 바잉턴 교수.
한국학연구소는 지난해 한국고고학 강좌를 개설하려 했으나 전임교수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실패했다. 게다가 고대사연구실이 지속될지도 불투명하다. 동북아역사재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의 후원 계약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이다. 바잉턴 교수는 “한국 대기업들의 후원을 바라지만 안 될 경우 미국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주 소장은 “외부 지원이 끊기면 고대사 연구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며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후원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대사연구실은 매년 세미나를 열고 책을 내면서 많은 실적을 냈다. 외국에서 한국 고대사를 연구해 책을 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학문과 출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 성과를 독촉하지 말고 신뢰를 갖고 장기적 안목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하버드대 캠퍼스는 아기자기하다. 인공적인 냄새가 나지 않고 자연친화적이다. 설립자 존 하버드의 동상이 있는 하버드 야드에서 책을 보거나 담소하는 학생들 중에 한국인도 보였다. 하버드대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은 300명 안팎. 인구가 한국의 수십 배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 유학생이 500여 명인 걸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 위상을 드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한국학연구소가 장차 더 늘어날 한국인 유학생의 구심점이자 자부심이 되기를 바란다.
상가가 즐비해 북적대는 하버드 광장으로 나오니 비가 쏟아진다. 어린 두 자녀에게 줄 선물로 하버드대 마크가 새겨진 티셔츠를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