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시장이 스트리밍으로 재편된 지금, ‘스밍’ 어뷰징이 문제가 되고 있다. [GETTYIMAGES]](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61/7b/71/32/617b71321374d2738276.jpg)
음악시장이 스트리밍으로 재편된 지금, ‘스밍’ 어뷰징이 문제가 되고 있다. [GETTYIMAGES]
그것이 케이팝이 태어난 토양이다. 그리고 불법 복제음반이 사실상 사라지고 음악시장이 스트리밍으로 재편된 지금, 팬들은 ‘스밍’을 한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곡을 반복적으로 재생해 순위를 올리는 행위다. 음원 차트 목적이 ‘어느 곡이 가장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지 집계’하는 데 있다면, 서비스의 빈틈을 악용한 어뷰징(abusing: 오남용이라는 뜻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에 올리려고 클릭 수를 조작하는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어느 곡이 가장 뜨겁게 사랑받는지’가 ‘스밍’을 통해 집계된다는 주장도 있다.
팬덤 세 과시 지표 된 CD 판매량
어느 쪽으로 보든, 추가 비용 없이 재생 횟수를 기록으로 남기는 스트리밍 시대에 ‘스밍’이 특정 문화권이나 집단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국에서 태어난 ‘스밍’ 문화가 케이팝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다만 ‘스밍’ 뒤에 있는 논리, 즉 인터넷상의 집단행동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공식적 결과를 끌어낸다는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한국에서 일찍 완성됐을 뿐이다. 인류에게 음악 차트라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날도 머지않았을지 모른다.반대편에 음반 차트가 존재한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실물 CD는 스트리밍에 밀려 세계적으로 사양세에 접어들었지만, 한국에서는 대대적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유야 많다. 예를 들어 몇 년 전만 해도 ‘실물 음반 판매량은 그 아티스트가 음악적으로 가치 있다는 방증’이라는 논리도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 그것이 최근에는 음원 차트의 대중적 신뢰도가 다소 저하되면서 발매 첫 주 CD 판매량으로 팬덤의 세를 측정하거나 과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또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팬 사인회 추첨을 위한 팬들의 대량구매다. 이를 두고도 갑론을박은 무수하다. 특히 최근에는 호화로운 패키지의 음반을 한 사람이 수백 장씩 구매하는 구조가 환경 파괴에 심각하게 일조한다는 주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해외 케이팝 팬덤에게는 종종 문화 다양성, 소수자 권리 등의 가치와 결부되는 경향이 있고, 케이팝은 이미 해외 팬 없이 지탱하기 힘든 규모에 도달한 지도 오래다. 지속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민감해진 지금 실물 음반이 과거 같은 지위를 유지한다는 보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음원 차트나 음반 판매량 시대가 저문다면 우리는 어떤 숫자로 케이팝을 이야기하게 될까. 이미 배급사 등의 보도자료에는 유튜브 조회수나 인스타그램 팔로어 수가 기재되지만, 적어도 이제까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음악 포맷보다 수명이 짧았던 것 같다. 앞으로 케이팝은 어떤 ‘지표’에 기대야 할까. 상상력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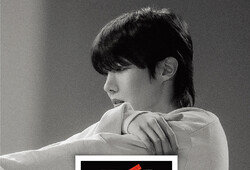












![[영상] 슈퍼개미 김영옥 “4년 치 일감 받아놓은 조선주 매력적”](https://dimg.donga.com/a/570/380/95/1/carriage/MAGAZINE/images/weekly_main_top/661da8741318d2738276.jpg)


![[영상] “엔비디아 랠리 안 끝나… 지금이 절호의 매수 찬스”](https://dimg.donga.com/a/380/253/95/1/carriage/MAGAZINE/images/weekly_main_top/661c61f207f8d273827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