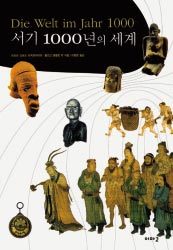
‘서기 1000년의 세계’의 독일인 저자 프란츠-요제프 브뤽게마이어와 볼프강 쉔클룬 외 7인이 본 세계는 “여러 문화들이 고유한 양식과 한계를 지키면서 발전하고 공존한 시대였고, 무수한 발견과 발명이 이루어졌으며, 동아시아가 문화 패권을 쥐고 있었다.” 책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다양한 시간 계산법부터 오락이나 스포츠까지 당시의 생활상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먼저 시간을 들여다보자. 당시의 시간이 지금과 같은 동일한 개념은 물론 아니었다. 귀족, 상인, 농부, 사제, 학자들은 각자 신분에 따라 고유한 시간을 살았다. 그러나 시간을 관찰하고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해시계·물시계·향시계·모래시계·촛불시계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간 측정도구를 발명했고, 이를 달력으로 체계화했다. 당시에도 밀레니엄이 시작된다고 지구촌이 들썩거리고 종말론이 기승을 부렸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중세를 암흑의 시대로 바라본 오늘날 사람들의 획일적인 시간관이 부른 결과일 뿐이라고 말한다.
문자는 오랫동안 사제나 학자 등 소수의 특권층들만 사용하며 평범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그런 탓에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전하는 일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유럽에서는 문자에 송아지나 염소, 양의 가죽을 이용했다. 만들기가 번거로운 데다 위낙 비싸고 귀하다 보니 생략이 많아 이전의 기록들을 긁어내고 그 자리에 새롭게 내용을 적어넣는 일도 가끔 생기곤 했다. 문자를 기록하는 행위는 고통스러운 수작업으로 이뤄졌다. 거기에 비하면 종이가 발명되고 인쇄술이 발달한 중국은 서너 발짝 앞서나갔다. 유교경전을 몇 만 단위에서 몇 십만 단위까지 발행해 판매하기도 했고, 문자를 예술로 승화시킨 서예가들은 이슬람과 동아시아에까지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예술문화는 비(非)문자적인 문화를 통해 양적·질적으로 풍부하게 전해진다. 동아시아의 세련된 회화가 우선 눈길을 끈다. 자연에 대한 탐구와 비평에서 탄생한 수준 높은 산수화가 대표적이다. 은은한 비취색과 단순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고려청자는 도자기 예술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상감(象嵌)기술을 이용한 상감청자는 단연 압권이다.
농업은 당시를 지탱한 원동력이자 모든 생활의 기반이었다. 지배자들은 농업경제로부터 세금과 공물을 거둬들였다. 농민들은 국가경제의 주역이었음에도 대부분 소작농이나 농노의 신분으로 조세와 부역에 시달려 곤궁한 삶을 이어갔다. 농업에 관한 지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치수(治水)는 지상과제가 되었다. 중국인들이 고안한 강에 떠다니는 ‘나무틀 논’이나 ‘진흙 논’, 이슬람인들이 관개농업을 위해 사막의 와디(평상시에는 물이 없다 비가 오면 생기는 하천)를 이용해 만든 거대한 인공저수지 등도 바로 이러한 치수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물이다.

현재 세계의 중심인 유럽과 아메리카는 1000년 전 변방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당연히 아시아와 중앙아메리카, 북아프리카의 거대한 문명이 주도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된다. 책은 세계사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위해 쓰여졌다. 역사와 문화유산들을 담은 200여장의 희귀 사진과 지도가 실려 있어 1000년 전의 세계를 조망하는 불가능하고 무모한 도전(?)에 성과를 더한다.
프란츠-요제프 브뤽게마이어·볼프강 쉔클룬 외 7인 지음/ 이동준 옮김/ 이마고 펴냄/ 468쪽/ 2만5000원
Tips프란츠-요제프 브뤽게마이어
철학박사이자 의학박사. 1998년까지 하노버 대학에서 근대사, 기술사, 환경사를 강의했으며, 현재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경제사 및 사회사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가운데 최근에는 환경사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생활사 관련 전시회를 여러 차례 기획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