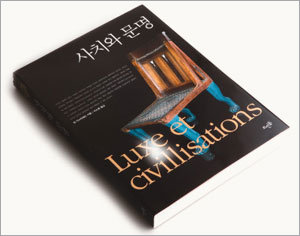
장 카스타레드 지음/ 이소영 옮김/ 뜨인돌/ 352쪽/ 2만2000원
“1882년 프랑스 브라상푸이에서 출토된 2만2000년 전 ‘두건을 쓴 부인’의 조각상을 보라. 후기 구석기인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자연의 위력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위가 아닌 ‘사치’를 열망했다.”
저자는 바로 이런 사치가 인류문명을 만들고 이끈 동인(動因)이라 보고, 인류문명과 사치는 동전의 양면 관계임을 풀어낸다. 여기서 사치란 물질적 호화로움뿐 아니라 종교와 정신, 문화예술적 욕망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책은 바빌론 공중정원, 이집트 피라미드, 아테네 판테온, 로마 콜로세움 같은 건축물에서부터 오늘날의 패션쇼, 호화 요트파티, 값비싼 액세서리까지 인류 사치의 흔적을 시대별, 나라별로 짚어간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왕의 사치를 살펴보면 이집트 파라오는 진귀하고 값비싼 보석을 두르고 금은 식기를 사용했으며, 다윗과 솔로몬왕은 순금 왕좌에 앉았고, 동방을 정복한 알렉산더대왕은 순금 침대에서 잤다. 그들의 사치를 증명하는 소문과 유물은 오늘날 우리의 입을 ‘쩍’ 벌리게 만든다.
로마인의 무절제한 향락과 사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몸단장에 필요한 직공, 자수업자, 보석세공인, 드레스 재단사 등이 체계적으로 분류돼 유행과 사치를 뒷받침했다. 의복과 장신구에 ‘사치세’를 매긴 로마 재무상 카토(기원전 234~149)는 “사치를 멀리하라. 모든 것을 취한 후에도 아무것도 없이 지내라”라며 로마인의 무절제함을 비판했다. 시칠리아의 프레스코화에선 ‘미니 팬티-브래지어’ 차림의 여성도 보인다. 오늘날의 ‘비키니’는 알고 보면 2000년 전 로마인이 놀이를 즐기려고 입었던 옷이다.
사치가 인류 문명 발전에 자극을 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도한 사치는 타락과 낭비를 넘어 문명 쇠퇴를 부른 원인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프랑스 루이 14세 시대, 로마 아우구스투스 시대, 그리스 페리클레스 시대를 사치의 정점으로 지목했다.
사치는 인류를 다스린 3개 계층에서 빠지지 않고 나타났다. 처음에는 종교 계급, 그리고 황실이 뒤를 잇는다. 이들은 유적과 의복, 물건, 축제의 사치스러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고 권위를 세웠다. 마지막 계승자는 상인으로 오늘날의 지배계층이다.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물질적 사치와 문화적 동력이 된 사치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치는 육체 본능의 욕망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요구다. 사치는 돈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라는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
오늘날 신흥경제강국 졸부는 명품 싹쓸이 쇼핑에 열중한다. 명품산업은 날이 갈수록 몸집이 커진다. 이 책은 ‘우리 시대 문명은 과연 무엇이고, 그 문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