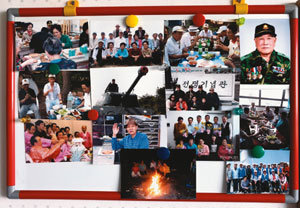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좋은 사람들의 쉼터’(쉼터). 중소기업 한성무역이 운영하는 이곳에 국군포로 할아버지 10여 명이 모여 있다. 평소 각자 살지만 수·목·금요일이면 여기에서 숙식한다. 얼마 전에는 단체로 팔순잔치 생일상도 받았다. 무엇보다 이곳에 오는 이유는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북한을 탈출해 생환한 국군포로들(2013년 5월 기준 80명 귀환, 51명 생존)은 이곳을 고향처럼 여긴다. 인터뷰 중 만난 국군포로들은 “국군포로를 위해 정부가 만든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며 애석해했다(국방부는 “국방부가 운영하는 국군포로 사회적응교육장을 국군포로 쉼터로 이용하고 있지만 그 장소를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5월 23일 이대홍(82·사진) 할아버지는 동료들과 강원 춘천시에 사는 한 국군포로의 병문안을 다녀온 참이었다. ㈔6·25국군포로가족회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2006년 10월 혈혈단신 귀환했다(국방부에 따르면 탄광에서 일한 국군포로의 마지막 탈북은 2010년 이뤄졌다).
현재 기댈 수 있는 건 돈뿐이다. 그는 귀국 당시 정부보상금 4억8000만 원(보수 소급액 3억1000만 원, 주거지원금 1억7000만 원)을 받았다. 거기에서 탈북 브로커에게 6000만 원을 줬으며, 자신의 전사통지서를 받고 제사를 지내준 조카에게 성의 표시를 한 뒤 남은 돈과 매달 나오는 군인연금 120만 원으로 생활한다. 국군포로 대부분이 보상금을 가족에게 맡겼다가 떼인 것에 비하면 상황이 양호한 편이다.
아오지탄광에서 53년 그의 둥지는 서울 구로구 조카네 집. 일주일에 사흘은 쉼터에 들르고 나머지 나흘은 6·25참전유공자회, 교회 노인대학에 간다. 탈북 직후 가족이 있는 경남 마산에서 살았지만 친구들과 여생을 보내고 싶어 상경했다. 자신이 북으로 간 뒤 태어난 가족과 정이 쌓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군포로라고 하면 경계부터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경남 진주가 고향인 그는 소학교를 마친 뒤 부산에서 목수 일을 했다. 그러다 영장이 나와 1952년 입대해 제주도에서 96일 동안 훈련받았고, 그해 9월 전선에 배치됐다. 정전을 한 달 앞둔 53년 6월 28일 백마고지(강원 철원 부근)에서 소대원들이 적군 총에 맞아 사망하고 그를 포함한 3명은 포로가 됐다.
처음에는 강원 이천 중공군 부대에서 정신교육을 받았다. 이후 9월 평안남도 강동수용소에 수용됐고, 북한군이 “북에 남을지 남으로 갈지 말하라”고 묻기에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차는 북으로 향했고, 그때부터 함경북도 경흥군 아오지탄광에서 53년 동안 살았다. 함께 잡혀온 국군포로는 600여 명에 달했다.
삶은 팍팍했다. 내무성 건설대란 군대에 배치돼 3년 동안 ‘반 교육, 반 노동’을 했다. 한 중대가 사상교육을 받으면, 다른 중대는 탄광에서 일하는 식이었다. 탄광에서 3교대로 일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지만 탈출은 시도하지 않았다. 탈주자들이 잡혀오는 걸 보고 묵묵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 군복 입은 국군포로가 도망가 잡히지 않는 건 불가능했다.
이후 1956년 ‘내각결정 43호’에 따라 부대가 해산했다. 생활은 조금 자유로워졌다. 부대가 아닌 합숙소에 있는 각자 방에서 생활했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정착금도 받아 세간 몇 가지도 샀다. 시간이 갈수록 ‘남한에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59년 결혼했다. 그의 아내는 아버지가 월남해 성분이 좋지 않아 그간 짝을 찾지 못한 상태.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내가 아들을 낳고 1년 만에 결핵으로 사망한 것이다. 탄광에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키워봤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4개월 만에 재혼했다.
두 아내, 외아들 북에 묻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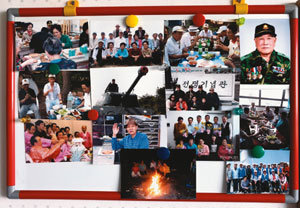
‘좋은 사람들의 쉼터’에 걸린 국군포로 사진.
그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생활이 나아질까 싶어 아오지 석탄 전문학교에서 4년간 공부해 학사학위를 받았지만 성분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작업반장도 될 수 없었다. 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를 원망했다. 국군포로 자식들은 성적이 뛰어나도 대학에 갈 수 없고, 군대에도 갈 수 없어 사실상 신분 상승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에 가입할 수 없는 건 물론이다.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은 아들은 탄광에서 병을 얻어 47세에 세상을 떠났다.
전처소생만 고이 키워준 두 번째 아내도 1998년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그는 만 60세 때 탄광에서 정년퇴직한 뒤 청년합숙소 경비로 일하며 끼니를 해결했고, 아들도 탄광에서 밥을 벌어먹었다. 하지만 아내는 아들이 부양가족 몫으로 받아온 식량 300g만 먹고선 연명할 수 없었다. 끝내 그는 아오지탄광에서 살다 탈북한 사람의 소개로 브로커를 만났고 주저하지 않고 탈북했다.
그가 남한에 돌아온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복무한 군대사단에 가서 전역신고를 한 것이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남한에 왔건만 전혀 기쁘지 않다. 그는 국군포로 문제에 무관심한 정부에 묻고 싶다. “남으로 돌아오기 위한 비용(브로커)을 정부가 아닌 국군포로에게 부담 지우는 게 마땅한 일인가.” “만약 당신네 아버지나 형이 국군포로로 북에 억류됐다면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국군포로에서 인민군으로 살다 귀환한 A씨
“얼떨결에 탈북…죽기 전 자식들과 통화라도 해봤으면”
| 5월 21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A(80) 씨 아파트를 찾았다. 그는 아파트 밖에서 기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사람들의 쉼터’에 가는 날이 아니면 별다른 소일거리가 없다고 했다.
그의 고향은 제주. 생활형편이 어려워 학교는 문턱도 넘어보지 못했고 부모와 농사지으며 살았다. 군대는 1951년 2월 입대했다. 한 달 동안 제주에서 훈련받은 뒤 전방에 투입됐고, 그해 5월 강원 양구에서 국군포로가 됐다. 놀랍게도 그는 곧바로 인민군이 됐다.
“강원 원산 인민군대 훈련소에서 한 달간 교육받고 인민군이 됐다. 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치학습에서 인민군은 못사는 인민들을 위한 군대라는 말에 넘어갔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강원도 부근에서 군생활을 했고, 1957년 제대명령을 받아 그때부터 황해남도 농촌에 정착했다. 다른 국군포로들처럼 탄광지역에 배치될 운명이었지만 약혼녀가 있다며 설득해 탄광행을 면했다. 그때부터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농사를 지었고, 58년 결혼했다. 생활은 편치 않았다. 학습회, 강연회, 작업반, 생활총회에 참석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그에겐 국군포로란 꼬리표가 늘 붙어 다녔다. 군당학교에서 1등을 했는데도 작업반장이 될 수 없었다. 자식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세 아들은 군관학교 입학 추천을 받았지만 아버지 성분 때문에 불합격됐다. 아들들이 “아버지와 관계없이 못 간 것이다. 일(상관)없다”며 위로하자 아버지는 ‘아이들이 똑똑해도 못난 아비 때문에 잘날 수 없다’며 자책했다.
2006년 어느 날 브로커가 그를 찾아왔다. 남한에 사는 돈 많은 친척이 중국으로 돈을 가져왔으니 함께 가자 했고, 그는 고향 소식이라도 알아보고자 큰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브로커는 “당신이 남한에 가야 당신 아들을 고향에 돌려보낼 수 있다”며 협박했다. 결국 그는 브로커 비용에 대한 각서를 쓴 뒤 탈북했다.
“당장 정부보상금을 받을 수 없어 남한에서 꾼 돈으로 브로커에게 돈을 보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다면서 국가안전보위부에 나의 탈북 사실을 폭로했고, 아들들이 숙청됐다.”
그는 귀환한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 2010년부터 부모 묘를 벌초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다. “소원이 있다”는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이들에게 돈이라도 보내주고 싶은데 답답하다. 여기 온 국군포로들은 북에 남겨진 가족과 통화한 뒤 돈을 보내니까 안심될 거다. 죽기 전 만날 수는 없더라도, 통화라도 해보고 싶다. 손자라도 한 명 데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