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원 기행’은 와인에 대한 천편일률적 지식이나 이론 혹은 까다로운 예법을 따지는 기존 와인 이야기와는 다르다. 호주의 유명 와인 산지를 직접 찾아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들의 인생과 와인 이야기를 담았다. 전직이 판사, 의사, 신문기자, 화가, 항공기 조종사, 철학 교수인 양조장 주인으로부터 포도농장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와인에 대한 독특한 인생철학과 애환, 사랑 이야기를 직접 듣고 채록했다.
울럼바이를 경유해 헌터밸리로 향하는 길, 클로드 모네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굽이굽이 휘어진 아스팔트 길로 레몬 빛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연록색 나무와 들판이 길손을 반겼다. 번개 맞아 검게 탄 유칼리나무는 벌러덩 나자빠져 있었다. 그 속에다 집을 지은 벌 무리가 안개꽃같이 붕붕댔다. 무지개 롤리킷 한 쌍은 서로를 희롱하며 소나무의 우듬지로 날아오르고 코카투 앵무새는 높은 가지에서 정물처럼 사색에 잠겨 있었다.
헌터밸리가 지금처럼 포도원의 낙원이 된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죄수에 대한 비인간적 학대와 이민에 대한 애환이 깃들어 있다. 호주 정착 초기 영국에서 유배돼 온 죄수들은 길도 만들고 다리도 건설하고 배가 드나들게 항구도 만들어야 했다. 또한 소와 양을 키우고 밀을 재배하기 위해 온종일 나무를 베어 목초지와 밭을 넓혀야 했다.
이런 고단한 삶을 위로하려면 종교가 필요했고, 그 종교의 엄숙한 예배의식을 치르는 데는 와인이 필요했다. 게다가 당시 호주에서는 화폐가 부족해 럼주 같은 술을 화폐 대용으로 삼았다. 영국은 가뭄과 홍수 등 열악한 자연환경 속 유배지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죄수들을 부려먹기 위해 인센티브 명목으로 중독성이 강한 담배나 술을 줬다.
죄수를 감독하는 관리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대개 가족과 떨어져 홀로 파견된 터라 외로움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해가 떨어져 밤이 이슥해지면 멀리서 딩고나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통나무로 지은 오두막집에 호롱불을 밝힌 후 들어앉으면 침대에 눕기 전까지 달리 할 일도 없었다. 창밖에 비라도 뿌리면 쓸쓸한 기분에 한잔 생각이 절로 났을 것이다.
호주의 와인 생산은 이처럼 이민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영국 정부는 와인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자 죄수를 실은 배에 포도나무도 함께 들여왔다. 이 포도나무를 처음으로 심은 곳이 지금의 뉴사우스웨일스 주, 그중에서도 헌터밸리였다. 이 지역을 포도나무 입성 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호주 내륙 지역 중 기후, 지질 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자 헌터밸리는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자급자족 형태의 와인 생산은 1800년대 중반 골드러시와 함께 호주 경제가 급격히 팽창하자 날로 확대됐다. 또 배서스트 섬과 빅토리아 주 등에서 금광이 터졌다는 소식은 많은 유럽인으로 하여금 이민대열에 합류하게 했고, 급작스러운 인구 증가는 자연스레 와인 수요도 늘게 했다. 이후 포도 재배지역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민의 역사와 함께한 와인
이민의 역사와 함께한 와인
헌터밸리 지역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포콜빈에 들어서면 바로 나오는 포도원이 레이크스 폴리(Lake’s Folly) 와이너리다. 다른 와이너리에 비해 비교적 작은 포도밭. 하지만 푸른 아침햇살 속 포도밭은 눈부심 때문인지 대단히 크게 느껴졌다. 마침 우편물을 수거하러 나오던 이곳의 보조 와인 양조가 피터 페이어드를 포도원 입구에서 만났다. 흰색 페인트로 칠한 와이너리로 들어서니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한 시음장이 나타났다. 와인도 만들고 손님이 오면 상담도 해주는 페이어드는 샤도네이 와인을 따라주며 말문을 열었다.
‘아침 나절부터 술이라…. 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법. 시도 때도 없이 마셔대는 이 동네에서 아침이라고 귀한 와인을 마다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잠깐 상념에 잠겼던 필자는 이내 페이어드가 건네주는 와인을 받아들었다.
“우리 포도원도 문을 연 지 좀 됐네요. 1963년의 일이죠. 외과 의사였던 맥스 레이크와 그 가족이 카베르네 소비뇽 품종을 심었는데 당시로는 꽤나 힘든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품종이 헌터밸리와 궁합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토질과 밭의 경사도 등을 고려해 여기 이곳을 찾는 데만 3년이나 걸렸다고 해요. 두꺼운 껍질과 씨 때문에 이걸로만 와인을 만들면 색도 진하고 타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프티트 베르도와 쉬라즈, 멀롯을 함께 넣어 블렌딩함으로써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중간 보디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맛을 창조해내는 데 성공했지요.”
카베르네 레드와인, 샤도네이 화이트와인만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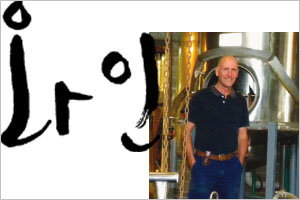 레이크스 폴리는 다른 와이너리처럼 이것저것 여러 종류의 와인을 만들지 않는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카베르네 레드와인과 샤도네이 화이트와인 딱 두 가지만 생산한다. 모든 포도를 밭에서 직접 재배해 가을이 되면 일일이 손으로 따서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다품종 와인을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레이크스 폴리는 다른 와이너리처럼 이것저것 여러 종류의 와인을 만들지 않는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카베르네 레드와인과 샤도네이 화이트와인 딱 두 가지만 생산한다. 모든 포도를 밭에서 직접 재배해 가을이 되면 일일이 손으로 따서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다품종 와인을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
“1년에 4500박스 정도를 만들어 단골 주문판매만 하고 있어요. 와인은 뭐니 뭐니 해도 포도의 신선함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선 새벽안개가 걷히기 전에 밭으로 나가 포도를 따야 하는데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났나 생각하고 주위를 돌아보면 이미 아침식사를 마친 새들이 나뭇가지에 평화롭게 앉아 깃털을 고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이따금 어스름한 밭에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옆에 캥거루가 시커멓게 서 있어 기겁하기도 하고요.”
레드와인은 포도즙이 공기와 넓게 접촉하게끔 개방된 콘크리트 통에 넣어 발효시키지만 화이트와인은 섬세한 맛을 위해 밀폐된 스테인리스 통에서 발효시킨다고 한다. 이렇게 발효시킨 와인은 봄이 되면 리무쟁 오크통으로 옮기는데 이때부터 신선하고 향긋한 참나무 향을 듬뿍 받으며 천천히 숙성된다. 그 시기가 인간으로 말하면 탄생과 성장기를 거쳐 모든 면에서 노련과 완숙미를 쌓아가는 30~40대라나 할까. 이러다 좀 더 무르익어 세상과 인생을 충분히 관조할 때가 오면 비로소 시드니 와인 애호가를 위해 마켓으로 나간다.
27년째 이곳에서 일한다는 페이어드는 장미에서 떨어지는 꽃물 같은 레드와인을 한 잔 더 권했다. 시큼 산뜻한 신선함과 어린 시절 감꽃을 씹었을 때 느꼈던 쌉쌀하고도 알싸한 맛에 달콤함까지 더해진 그 맛. 와인 향기가 혀를 한 번 후려치더니 혀 돌기를 일제히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한 잔의 와인에 시면서도 상쾌하고 쓰면서도 달콤한 인생의 모든 맛이 녹아 있다니 참으로 놀라웠다. 그래서 호주에선 이런 말까지 나왔다.
“헌터밸리에 가보지 않고는 와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곳 와인을 마셔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다.”
울럼바이를 경유해 헌터밸리로 향하는 길, 클로드 모네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굽이굽이 휘어진 아스팔트 길로 레몬 빛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연록색 나무와 들판이 길손을 반겼다. 번개 맞아 검게 탄 유칼리나무는 벌러덩 나자빠져 있었다. 그 속에다 집을 지은 벌 무리가 안개꽃같이 붕붕댔다. 무지개 롤리킷 한 쌍은 서로를 희롱하며 소나무의 우듬지로 날아오르고 코카투 앵무새는 높은 가지에서 정물처럼 사색에 잠겨 있었다.
헌터밸리가 지금처럼 포도원의 낙원이 된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죄수에 대한 비인간적 학대와 이민에 대한 애환이 깃들어 있다. 호주 정착 초기 영국에서 유배돼 온 죄수들은 길도 만들고 다리도 건설하고 배가 드나들게 항구도 만들어야 했다. 또한 소와 양을 키우고 밀을 재배하기 위해 온종일 나무를 베어 목초지와 밭을 넓혀야 했다.
이런 고단한 삶을 위로하려면 종교가 필요했고, 그 종교의 엄숙한 예배의식을 치르는 데는 와인이 필요했다. 게다가 당시 호주에서는 화폐가 부족해 럼주 같은 술을 화폐 대용으로 삼았다. 영국은 가뭄과 홍수 등 열악한 자연환경 속 유배지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죄수들을 부려먹기 위해 인센티브 명목으로 중독성이 강한 담배나 술을 줬다.
죄수를 감독하는 관리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대개 가족과 떨어져 홀로 파견된 터라 외로움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해가 떨어져 밤이 이슥해지면 멀리서 딩고나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통나무로 지은 오두막집에 호롱불을 밝힌 후 들어앉으면 침대에 눕기 전까지 달리 할 일도 없었다. 창밖에 비라도 뿌리면 쓸쓸한 기분에 한잔 생각이 절로 났을 것이다.
호주의 와인 생산은 이처럼 이민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영국 정부는 와인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자 죄수를 실은 배에 포도나무도 함께 들여왔다. 이 포도나무를 처음으로 심은 곳이 지금의 뉴사우스웨일스 주, 그중에서도 헌터밸리였다. 이 지역을 포도나무 입성 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호주 내륙 지역 중 기후, 지질 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자 헌터밸리는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자급자족 형태의 와인 생산은 1800년대 중반 골드러시와 함께 호주 경제가 급격히 팽창하자 날로 확대됐다. 또 배서스트 섬과 빅토리아 주 등에서 금광이 터졌다는 소식은 많은 유럽인으로 하여금 이민대열에 합류하게 했고, 급작스러운 인구 증가는 자연스레 와인 수요도 늘게 했다. 이후 포도 재배지역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됐다.

헌터밸리 지역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포콜빈에 들어서면 바로 나오는 포도원이 레이크스 폴리(Lake’s Folly) 와이너리다. 다른 와이너리에 비해 비교적 작은 포도밭. 하지만 푸른 아침햇살 속 포도밭은 눈부심 때문인지 대단히 크게 느껴졌다. 마침 우편물을 수거하러 나오던 이곳의 보조 와인 양조가 피터 페이어드를 포도원 입구에서 만났다. 흰색 페인트로 칠한 와이너리로 들어서니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한 시음장이 나타났다. 와인도 만들고 손님이 오면 상담도 해주는 페이어드는 샤도네이 와인을 따라주며 말문을 열었다.
‘아침 나절부터 술이라…. 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법. 시도 때도 없이 마셔대는 이 동네에서 아침이라고 귀한 와인을 마다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잠깐 상념에 잠겼던 필자는 이내 페이어드가 건네주는 와인을 받아들었다.
“우리 포도원도 문을 연 지 좀 됐네요. 1963년의 일이죠. 외과 의사였던 맥스 레이크와 그 가족이 카베르네 소비뇽 품종을 심었는데 당시로는 꽤나 힘든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품종이 헌터밸리와 궁합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토질과 밭의 경사도 등을 고려해 여기 이곳을 찾는 데만 3년이나 걸렸다고 해요. 두꺼운 껍질과 씨 때문에 이걸로만 와인을 만들면 색도 진하고 타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프티트 베르도와 쉬라즈, 멀롯을 함께 넣어 블렌딩함으로써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중간 보디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맛을 창조해내는 데 성공했지요.”
카베르네 레드와인, 샤도네이 화이트와인만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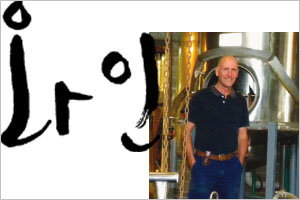
레이크스 폴리의 보조 와인 양조가 피터 페이어드.
“1년에 4500박스 정도를 만들어 단골 주문판매만 하고 있어요. 와인은 뭐니 뭐니 해도 포도의 신선함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선 새벽안개가 걷히기 전에 밭으로 나가 포도를 따야 하는데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났나 생각하고 주위를 돌아보면 이미 아침식사를 마친 새들이 나뭇가지에 평화롭게 앉아 깃털을 고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이따금 어스름한 밭에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옆에 캥거루가 시커멓게 서 있어 기겁하기도 하고요.”
레드와인은 포도즙이 공기와 넓게 접촉하게끔 개방된 콘크리트 통에 넣어 발효시키지만 화이트와인은 섬세한 맛을 위해 밀폐된 스테인리스 통에서 발효시킨다고 한다. 이렇게 발효시킨 와인은 봄이 되면 리무쟁 오크통으로 옮기는데 이때부터 신선하고 향긋한 참나무 향을 듬뿍 받으며 천천히 숙성된다. 그 시기가 인간으로 말하면 탄생과 성장기를 거쳐 모든 면에서 노련과 완숙미를 쌓아가는 30~40대라나 할까. 이러다 좀 더 무르익어 세상과 인생을 충분히 관조할 때가 오면 비로소 시드니 와인 애호가를 위해 마켓으로 나간다.
27년째 이곳에서 일한다는 페이어드는 장미에서 떨어지는 꽃물 같은 레드와인을 한 잔 더 권했다. 시큼 산뜻한 신선함과 어린 시절 감꽃을 씹었을 때 느꼈던 쌉쌀하고도 알싸한 맛에 달콤함까지 더해진 그 맛. 와인 향기가 혀를 한 번 후려치더니 혀 돌기를 일제히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한 잔의 와인에 시면서도 상쾌하고 쓰면서도 달콤한 인생의 모든 맛이 녹아 있다니 참으로 놀라웠다. 그래서 호주에선 이런 말까지 나왔다.
“헌터밸리에 가보지 않고는 와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곳 와인을 마셔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