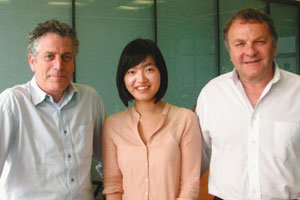
5월 3일 이스라엘 테펜 IMC 본사에서 이 회사 제이콥 하파즈 회장(오른쪽), 이 회사의 자회사인 ISCAR 이란 게리 부사장(왼쪽)과 함께.
한편으로는 뿌듯했고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취재 때마다 만난 기업인들에게 “이스라엘에는 대기업이 없습니까?”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가에게 “나중에 제조공장을 직접 세우거나 다른 분야에 진출해 기업 규모를 키우고 싶지 않나요?”라고 묻자 그는 확고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내 몫은 여기까지다”라고요.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워낙 분야가 많아 머리가 복잡해지지만, 이스라엘 회사들은 단순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소위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굳이 ‘동반성장’이라는 문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벤처는 독자적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에서 인정받습니다. 벤처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창업자는 회사를 더욱 키워줄 수 있는 기업을 찾아 좋은 값에 넘깁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유대인 특유의 도전적 기질 때문일 수도 있고, 더 많은 회사를 세워 ‘이스라엘’이라는 파이를 키우려는 애국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한 한국 인터넷 벤처 창업가에게 “왜 한국 벤처는 이스라엘처럼 안 되나요?”라고 투덜거리자, 그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NHN이 없잖아요”라고요. 새로운 벤처가 성장하려고 하면 NHN으로 상징할 수 있는 대기업이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어 벤처가 개척한 시장을 잠식한다는 거죠. 그러니 벤처가 설 자리가 없고, 고사할 수밖에 없겠죠. 최소 1~2년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청년실업률은 점차 감소한다지만, 청년실업 체감온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소위 SKY대학 05학번’인 기자의 대학 친구 가운데 목표로 하던 직장을 찾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한때는 똑똑하기로 유명했던 ‘미래의 변호사’ ‘미래의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부분 ‘신림동 고시폐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가끔은 답답한 마음에 “우리 사업이나 할까?”라며 낄낄거립니다. 말이야 금방이라도 ‘사장님’ ‘회장님’이 될 것 같지만,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맨주먹입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은 다릅니다. 대학 진학률은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훨씬 도전적이고 진취적입니다. 벤처 인큐베이팅 업체가 창업 아이템을 선택해주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안을 고치고 다시 팀을 꾸립니다. 겁 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들의 실패를 높이 평가하고 보듬어주는 이스라엘이 부러웠습니다. 반면 기자를 포함한 청년 대부분은 ‘창업’ 혹은 ‘개척’이란 단어에 이미 겁부터 집어먹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단순히 한국 청년들이 못나서일까요?














![[영상] “이차전지 질적 성장 이끌 실리콘 음극재 기업 주목할 만”](https://dimg.donga.com/a/570/380/95/1/carriage/MAGAZINE/images/weekly_main_top/6626ea62187ed27382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