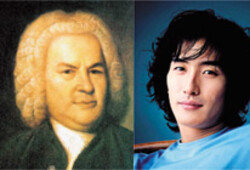신체의 가장 아래에 있는 발. 발의 크기를 생각하면, 그 안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궁리를 해본들 구두의 유행에는 큰 변화가 생길 여지가 없을 듯하다. 하지만 예민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최근 여성 구두의 코가 매우 동그랗고 짧아졌음을 알아챘을 것이다.
결국 구두는 코 길이나 굽 높이, 모양 정도에서 상상력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처럼 작은 부분임에도 구두만큼 다양한 의미를 지닌 패션 아이템도 드물다.
‘shoes’의 어원 자체가 ‘가리다’ ‘모호하게 하다’와 관련 있어, 발이란 ‘숨겨야 하는 무엇’으로 인식돼왔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적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나타내기 위해 샌들 바닥에 적의 모습이나 이름을 새겨넣고 다녔으며, 로마의 개선장군은 사자머리를 새긴 부츠를 신음으로써 승자의 위용을 드러냈다.
또한 패션 시스템 전체가 그렇듯, 구두 역시 지위나 권력의 표상이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계급마다 착용할 수 있는 신발은 엄격히 구분 통제돼왔다.
한편 19세기에는 남성이 자신의 부를 공유하겠다는 뜻으로 결혼할 여성의 신발을 도자기 모형으로 제작, 그녀에게 선물해 사랑의 증표로 삼았다. 신발이 다산, 행운, 화합을 상징했던 민속적 흔적은 지금도 서양에서 신혼부부의 자동차 뒤에 낡은 부츠를 매다는 관습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구두의 가장 특별한 의미는 성적 상징성에 있는 것 같다. 신데렐라의 이복언니들이 억지로 유리구두에 발을 맞추느라 발뒤꿈치를 잘라내 구두 속에 피가 흥건했다는 엽기적 이야기가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동화의 원래 버전이다. 이 이야기는 구두와 직결된 여성의 발 크기가 갖는 성적 함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런가 하면 남성에게 구두는 직접적인 성적 상징물 구실을 했다. 고딕시대에 처음 등장한 풀렌(Poulaine)이라는 신발이 대표적인 예로, 앞코가 길고 끝이 점점 뾰족해지는 기이한 디자인이었다. 그리고 길고 뾰족한 앞부리에 말총을 넣어 패딩한 뒤 끝부분이 위로 구부러지게 만들었는데, 그 끝에는 금줄이나 은줄을 달아 무릎에 착용한 가터(garter·양말 대님)에 매달았다. 신발의 길이는 신분에 따라 달랐는데 가장 긴 것은 60cm에 달하기도 했다. 길면 길수록 강한 남성임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처럼 좁고 긴 구두를 신느라 발가락들이 서로 겹쳐지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남성들은 남근 상징적인 신발을 애호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한 신발업자가 소장하고 있는 풀렌에는 ‘성적인 자급자족을 경험할 수 있는 구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여성에게도 특별한 용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교황 우르반 5세를 비롯한 성직자들이나 영국의 에드워드 4세, 프랑스의 샤를 5세 등 공공도덕의 수호자들은 이 신발을 성적으로 매우 음탕하다고 비난하고 금지령도 내렸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현대 남성들에게 구두는 패션의 완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외출할 때 마지막 점검으로 구두코에 광을 내면서 한번쯤은, 풀렌의 길이로 남성다움을 과시하던 옛 남자들에게서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생각해봄 직하다.
결국 구두는 코 길이나 굽 높이, 모양 정도에서 상상력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처럼 작은 부분임에도 구두만큼 다양한 의미를 지닌 패션 아이템도 드물다.
‘shoes’의 어원 자체가 ‘가리다’ ‘모호하게 하다’와 관련 있어, 발이란 ‘숨겨야 하는 무엇’으로 인식돼왔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적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나타내기 위해 샌들 바닥에 적의 모습이나 이름을 새겨넣고 다녔으며, 로마의 개선장군은 사자머리를 새긴 부츠를 신음으로써 승자의 위용을 드러냈다.
또한 패션 시스템 전체가 그렇듯, 구두 역시 지위나 권력의 표상이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계급마다 착용할 수 있는 신발은 엄격히 구분 통제돼왔다.
한편 19세기에는 남성이 자신의 부를 공유하겠다는 뜻으로 결혼할 여성의 신발을 도자기 모형으로 제작, 그녀에게 선물해 사랑의 증표로 삼았다. 신발이 다산, 행운, 화합을 상징했던 민속적 흔적은 지금도 서양에서 신혼부부의 자동차 뒤에 낡은 부츠를 매다는 관습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구두의 가장 특별한 의미는 성적 상징성에 있는 것 같다. 신데렐라의 이복언니들이 억지로 유리구두에 발을 맞추느라 발뒤꿈치를 잘라내 구두 속에 피가 흥건했다는 엽기적 이야기가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동화의 원래 버전이다. 이 이야기는 구두와 직결된 여성의 발 크기가 갖는 성적 함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런가 하면 남성에게 구두는 직접적인 성적 상징물 구실을 했다. 고딕시대에 처음 등장한 풀렌(Poulaine)이라는 신발이 대표적인 예로, 앞코가 길고 끝이 점점 뾰족해지는 기이한 디자인이었다. 그리고 길고 뾰족한 앞부리에 말총을 넣어 패딩한 뒤 끝부분이 위로 구부러지게 만들었는데, 그 끝에는 금줄이나 은줄을 달아 무릎에 착용한 가터(garter·양말 대님)에 매달았다. 신발의 길이는 신분에 따라 달랐는데 가장 긴 것은 60cm에 달하기도 했다. 길면 길수록 강한 남성임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처럼 좁고 긴 구두를 신느라 발가락들이 서로 겹쳐지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남성들은 남근 상징적인 신발을 애호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한 신발업자가 소장하고 있는 풀렌에는 ‘성적인 자급자족을 경험할 수 있는 구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여성에게도 특별한 용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교황 우르반 5세를 비롯한 성직자들이나 영국의 에드워드 4세, 프랑스의 샤를 5세 등 공공도덕의 수호자들은 이 신발을 성적으로 매우 음탕하다고 비난하고 금지령도 내렸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현대 남성들에게 구두는 패션의 완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외출할 때 마지막 점검으로 구두코에 광을 내면서 한번쯤은, 풀렌의 길이로 남성다움을 과시하던 옛 남자들에게서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생각해봄 직하다.